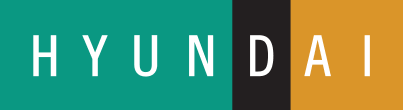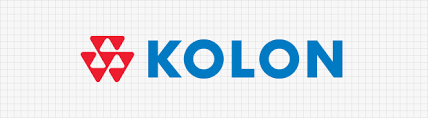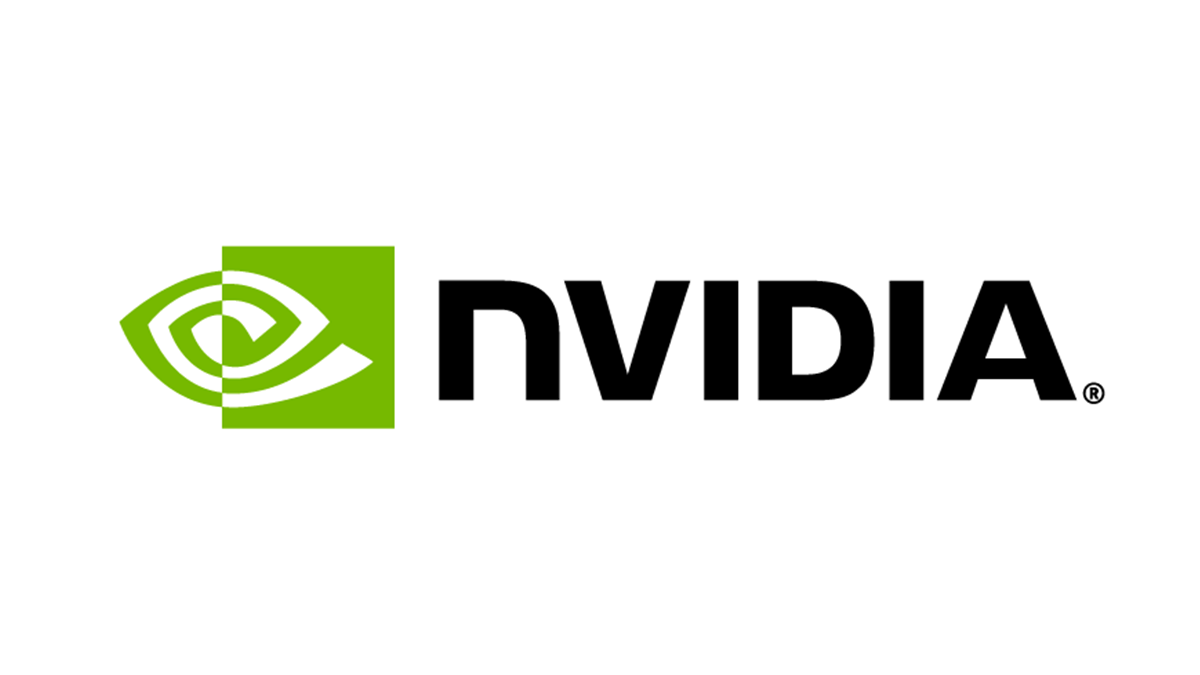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서민 차주들에겐 별다른 영향이 없고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다수의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예금하면 이론적으로 수십억원의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여야 정책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6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확실시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반대했다. 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오히려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추가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금융권별로 약 1~2% 안팎에 불과해 서민 차주 보호라는 정책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야가 가리지 않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도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현금 인출)을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를 본격화했다. SVB의 초고속 파산 원인으로 '디지털 뱅크런'이 지목되면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뉴스가 나오자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 다른 곳에 맡기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호한도 상향을 통한 뱅크런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서민 차주의 대출금리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보호한도 상향으로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추가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금융권별로 약 1~2% 안팎이다. 한도 상향 효과가 미미하고 혜택을 받는 예금자도 주로 고액 자산가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받고 서민 차주들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려면 금융사들이 예보에 지급하는 예보료율(예금 잔액의 0.08~0.4%)를 높여야 하는데, 결국 이 비용이 예금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가 보증하는 예금 규모가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부실 금융사인 것을 알면서도 예금을 맡기게 된다. 또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를 핑계로 예금을 끌어모아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등 금융시스템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금융회사들이 예보에 내야 하는 비용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오르는 식으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