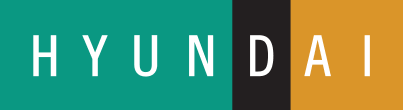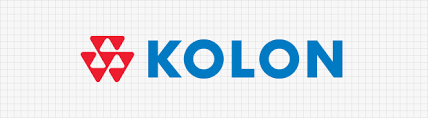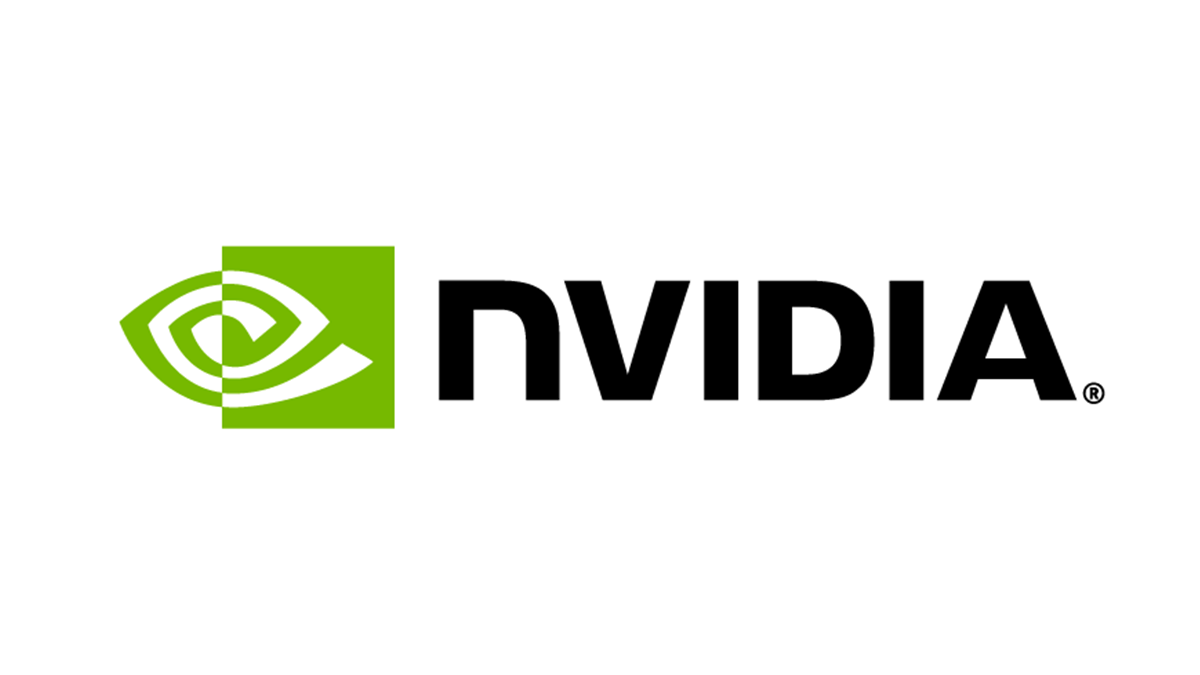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28일(현지 시각) 배런스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호황 속에서도 구직난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통계국(BLS) 자료에 따르면, 9월 비농업 일자리는 25.4만 개 증가했고, 실업자 수는 6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0만 명 감소했다. 임금도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호조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규직 일자리가 전년 대비 48.5만 개 감소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분야와 정부 재정지출에 의존한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정규직 일자리의 대규모 감소가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구인·이직 보고서(JOLTS)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8월 고용률은 3.3%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개된 채용 공고와 실제 채용 사이의 '매칭률'을 보여주는 데이터인 레벨리오 랩스(Revelio Labs)의 분석에 따르면, 구인 공고 대비 실제 채용 성사 비율이 팬데믹 이전 80%에서 현재 41%까지 급락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빠르게 변화한 반면, 노동시장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스매치 현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청년실업률이 14.2%를 기록하는 가운데 IT,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역시 구인배율이 1.6배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기업과 구직자 간 기대 불일치로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도 IT·바이오 분야의 구인난과 청년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구직자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 생명공학 전공자들은 수십 차례 지원서를 제출하고도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경제학 석사 학위 소지자들도 수백 건의 지원서를 제출한 끝에 겨우 10% 정도의 응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적 요인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1일 발표될 10월 고용지표는 세 가지 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요 경합주의 부동표를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경제지표다. 둘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셋째, 주가수익비율(PER)이 37배에 달하는 S&P500지수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9월의 25만4000명에서 12만3000명으로 크게 둔화되고, 실업률은 4.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전망치를 벗어나는 모든 시나리오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9월 연준의 0.5%포인트 금리인하 이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6%에서 4.3%로 급등한 상황에서, 10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경우 금리가 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당시에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동시에 10%를 웃도는 비교적 명확한 문제였으나, 현재는 완전고용 속 구직난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여기에 산업구조 재편, 디지털 전환, 원격근무 확산 등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가 더해져 문제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연준은 이제 단순한 고용지표를 넘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향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