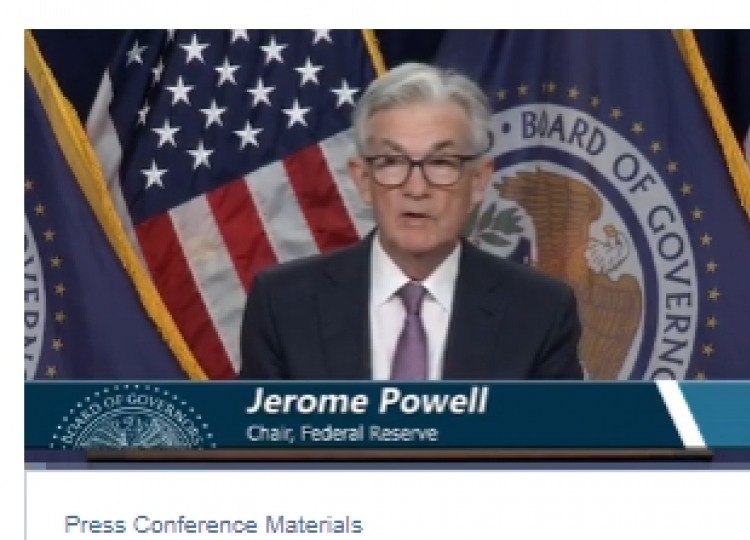모듈형 '랜드 캐리어'로 2026년 양산 시동, 3단계 로드맵 가동
30만弗 '빅토이'로 관광 시장 선점…"궁극적 목표는 통합형"
30만弗 '빅토이'로 관광 시장 선점…"궁극적 목표는 통합형"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왕탄(Wang Tan) 아리지 부사장은 대구에서 열린 '퓨처 이노베이션 테크 엑스포(FIX 2025)' 연설을 통해 "모든 사람이 쉽게 날 수 있는 미래, 즉 '비행의 자유'가 우리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아리지는 과거 '샤오펑 에어로HT'로 알려졌으나, 지난 10월 두바이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국제 브랜드를 출범시켰다.
이 행사에서 아리지는 모듈형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Land Aircraft Carrier)'의 첫 공개 유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시에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의 유통업체로부터 총 600대 규모의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플라잉카 부문에서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해외 대량 거래로 기록된다.
상용화를 위한 생산 기반도 마련됐다. 아리지는 2026년부터 대량 생산 및 인도를 목표로 광저우에 플라잉카 전용 제조 기지를 완공하고 양산 준비에 돌입했다.
첫발은 '관광용 빅 토이'…中 300개 비행 캠프 가동
왕 부사장은 아리지의 개발 계획이 레크리에이션 용도에서 시작해 점차 장거리 통합형 플라잉카로 나아가는 "의도적인 3단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다. 왕 부사장은 "첫 단계는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비행 캠프'로 가서 날릴 수 있는 '커다란 장난감(big toy)'과 같다"고 정의했다. 이 모델은 6륜 '모선(mothership)' 지상 차량과 분리형 멀티로터 공중 모듈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를 띤다. 밴(van) 스타일의 모선이 항공기를 운반, 보관, 충전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공중 모듈이 실제 수직 이착륙과 저고도 비행을 담당한다.
아리지는 이미 중국 본토에서 '비행 캠프'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곳은 소유주가 관광 비행을 위해 합법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된 통제 공역이다. 왕 부사장은 "중국 내에 약 300개의 비행 캠프가 마련되어 있다"며 "첫 번째 제품은 에어택시 임무가 아닌 개인 관광용"이라고 명확히 했다.
초기 고객은 지상 차량과 공중 모듈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매하게 된다. 가격은 "30만 달러(약 4억 3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급 스포츠카와 비슷한 가격대다.
두 번째 단계는 'A868'로 명명된 하이브리드-전기 틸트로터 플라잉카에 중점을 둔다. 이 기체는 관광용을 넘어 장거리 지역간 이동을 위해 설계됐다. 샤오펑 측은 A868이 회사의 X5 장거리 eVTOL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시속 360km 이상의 속도로 500km 이상 비행할 수 있고 다인승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왕 부사장은 "두 번째 단계인 장거리 항공기 개발은 이미 시작됐으며, 올해 말까지 콘셉트와 일부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500km 이상을 쉽게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는 도시 간 지점 간(point-to-point) 이동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중국 유인 eVTOL 시장 백서에서 이 부문을 주요 성장 분야로 지목한 바 있다. BCG는 중국의 eVTOL 부문이 개인용 비행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합쳐 2040년까지 약 41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이 eVTOL 대규모 배치를 달성하는 최초의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아리지는 도로 주행과 항공 기능을 바퀴와 통합 비행 시스템을 갖춘 단일 차량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왕 부사장은 이러한 디자인을 실험했지만, 현재의 배터리 기술이 여전히 명확한 한계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퀴까지 완전히 통합된 초기 차량 테스트 결과, 비행시간이 "단 2~3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왕 부사장은 "비행이나 양력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모든 킬로그램은 '데드 웨이트(dead weight)'"라며, 아리지가 항공기에 단순히 바퀴를 부착하는 대신 복잡한 모듈형 구성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20분 만에 완충…'안전·대량생산'이 상용화 열쇠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의 핵심 기술은 '원버튼' 전환 기능이다. 모선은 후방 격실에 공중 모듈을 보관하며, 비행 캠프에서 자동 기계식 도킹 메커니즘을 통해 단일 명령으로 항공기를 분리시키거나 다시 부착한다.
왕 부사장은 바퀴, 서스펜션 등 무거운 자동차 시스템을 지상 모선으로 이동시켜 비행 모듈의 불필요한 질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바퀴와 모든 자동차 시스템을 항공기 자체에 장착한다면, 결코 오래 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모선은 항공기를 위한 이동식 충전소 역할도 겸한다. 샤오펑의 최신 전기차와 유사한 800볼트(V) 고전압 시스템을 탑재했다. 왕 부사장은 "단 20분이면 (항공기가) 완전히 충전된다"며, 모선이 공중 모듈을 반복적으로 재충전하여 소유주가 여러 번의 짧은 비행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리지의 접근 방식은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항공 중심의 eVTOL 플레이어들과 차별화된다. 왕 부사장은 "장거리 기체들은 진화할수록 모두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는 더 자동차에 가깝다. 우리는 자동차에 날개를 달아 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왕 부사장은 시연 단계에서 대량 배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도전 과제로 '안전성'과 '양산성'을 꼽았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안전"이라며, 초기 X2 및 X3 플랫폼이 항공 등급의 신뢰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중 프로펠러와 고도의 이중화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3개의 서로 다른 비행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어,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두 개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
인증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아리지는 현재 중국 규제 당국과 감항성(airworthiness) 승인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왕 부사장은 "유인 eVTOL 항공기에 대한 중국 형식 인증(TC) 절차를 언급하며 "올해 말까지 TC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목표를 밝혔다. 초기에는 지정된 지역의 저고도 '비행 캠프'가 화이트리스트 시스템 하에 초기 배치 구역 역할을 하게 된다.
아리지는 중동 걸프 지역을 첫 번째 해외 출시 시장으로 삼고, 2027년 소비자 판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 보도와 회사 발표를 종합하면, 아리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00대 이상의 주문 및 사전 주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Air)'와 '다리(Bridge)'를 결합한 '아리지'라는 브랜드명처럼, 이들의 행보는 eVTOL과 신규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저고도 경제' 구축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리지는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 등 자금이 풍부한 미국 업체들과 중국의 강력한 라이벌 이항(EHang) 등이 포진한 치열한 첨단 항공 모빌리티(AAM)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업계는 전 세계 유인 eVTOL 시장이 2040년까지 약 2250억 달러(약 3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중국이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
왕 부사장은 도시형 에어택시 네트워크를 즉각 추구하기보다 개인 비행과 관광으로 시작하는 아리지의 전략이 대중의 친숙도와 운영 경험을 쌓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단계별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우리가 3단계 전략을 내놓은 이유"라고 그는 말했다.
이제 아리지의 최우선 과제는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가 대규모로 제작, 인증, 인도될 수 있음을 시장에 증명하는 것이다. 왕 부사장은 "설계 후에는 반드시 제조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의 플라잉카 공장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미래 도시에 플라잉카가 널리 도입될지는 규제, 인프라, 그리고 대중의 수용성에 달려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장 가동, 해외 수주 확보,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갖춘 아리지가 이제 콘셉트 단계를 넘어 상업적 현실의 첫 번째 단계로 확실하게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