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 쏟아부어도 '물리적 한계'…HBM·패키징·선단공정 씨 말라
빅테크만 간신히 '입장권'…스타트업 칩 출시는 2029년에나 가능
빅테크만 간신히 '입장권'…스타트업 칩 출시는 2029년에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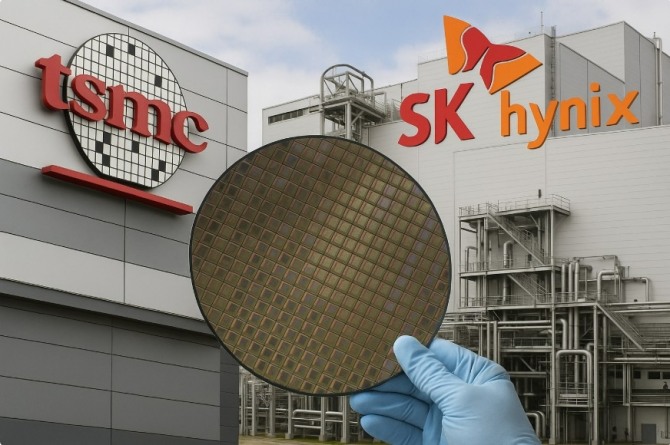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시하던 2025년 3분기 실적 시즌, TSMC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기업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장밋빛 전망' 대신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다. 현재의 AI 인프라 구축 속도가 자본 부족이 아닌, 해결 불가능한 '세 가지 물리적 병목(Physical Choke Points)'에 의해 강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에 집행될 수백조 원의 설비투자(CAPEX)로도 이 물리적 벽을 단기간에 넘기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고 있는 3대 장벽은 △선단(Leading-edge) 파운드리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Advanced Packaging)이다. 디지타임스 등 외신과 주요 기업 CEO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 핵심 자원들은 내년은 물론 향후 3~5년 치 물량이 이미 바닥난 상태다.
"HBM 2년 치 매진"…부품 아닌 '권력' 등극
AI 하드웨어 스택의 단순 구성품이었던 HBM은 이제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킹메이커'이자 가장 희소한 전략 물자가 됐다. 이제 HBM은 구매(Buy)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8~24개월 전에 배급을 예약(Reserve)하고 할당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자원이 됐다.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드러난 업계 리더들의 발언은 적나라하다. 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CFO)은 "2026년 HBM 공급 물량은 이미 전량 매진(Sold out)됐으며, 2027년까지도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 역시 "2025~2026년 생산 능력(Capa) 예약이 끝났다"고 밝혔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또한 공격적인 증설에도 불구하고 내년 고객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공급망 붕괴의 충격은 전방위적이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Blackwell Ultra)', '루빈(Rubin)', AMD의 'MI400' 등 차세대 플랫폼들이 메모리 수급 한계에 부딪혀 출시 로드맵이 꼬이고 있다. GPU와 AI 서버의 리드타임(주문 후 납기)은 12~18개월로 늘어졌고, 조달 현장은 물량 확보를 위한 전쟁터로 변했다.
더 큰 문제는 '풍선 효과'다. HBM 라인 증설이 기존 범용 D램(DRAM) 라인을 잠식하면서 DDR5, LPDDR5는 물론 구형 공정까지 생산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2026년까지 노트북, 스마트폰, 전장용 반도체 시장에 기습적인 공급 부족(Shortage)을 야기할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3나노 칩도 고철 만드는 '패키징 병목'
설령 운 좋게 3나노(nm) 칩렛과 HBM을 확보했다 해도, 'CoWoS(Chip on Wafer on Substrate)' 슬롯을 잡지 못하면 그 칩은 비싼 장식품에 불과하다. TSMC의 CoWoS 공정은 인터포저와 실리콘 관통 전극(TSV)을 통해 칩들을 하나로 묶는 최종 관문이다. 이제 실리콘 웨이퍼 생산보다 이 '조립(Assembly)' 단계가 AI GPU 생산 총량을 결정하는 통제 변수가 됐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CEO는 "CoWoS 생산 능력은 극도로 부족하며 2026년까지 매진 상태"라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최소 2026년 중반까지 패키징 용량이 초과 청약 상태"라며 이것이 제품 양산의 직접적인 지연 사유임을 인정했다.
TSMC가 2025년 60%, 2026년 50%씩 용량을 늘리며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신규 클린룸은 완공되기도 전에 주인이 정해진다. AMD, 브로드컴,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한정된 패키징 슬롯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선단 파운드리 봉쇄…"23년 예약자 외 출입금지"
3나노(N3E)나 2나노(N2) 생산 능력을 2023년에 미리 선점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사실상 선단 공정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됐다. TSMC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막론하고 선단 노드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 애플이 2024~2025년 3나노 물량의 대부분을 휩쓸어갔다. 잔여 물량은 엔비디아와 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 몫이었다. 미국 애리조나와 대만 가오슝의 2나노 팹(Fab)이 2026년 말 가동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사전 할당(Pre-allocated)이 끝났다. 삼성전자의 GAA(Gate-All-Around) 공정이 수율과 전력 효율 면에서 추격에 난항을 겪으면서, 전 세계 AI 산업이 TSMC라는 단일 공급망에 목을 매는 위험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AI 스타트업이나 뒤늦게 칩 개발에 뛰어든 프로젝트의 테이프아웃(Tape-out·설계 완료) 시점은 빨라야 2028~2029년으로 밀려날 처지다. 사실상 3년 이상의 '강제 휴지기'를 갖게 되는 셈이다.
'여유 제로' 시대…민간 조달망이 생존 열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업계 리더들의 전망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TSMC, 삼성,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2000억 달러(약 280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도, 2026~2027년 공급은 수요 대비 20~50%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격차를 줄이려 노력 중"이라는 TSMC의 말은 역설적으로 그 격차가 메우기 힘들 만큼 거대하다는 고백이다.
제조사의 공식 공급망(Official Pipeline)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기업들의 생존 전략도 바뀌고 있다. 퓨전 월드와이드(Fusion Worldwide)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유통 전문 기업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제조사 직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전 세계 유통망의 실시간 재고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한 민간 조달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공급망 관리(SCM)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것이다.
결국 지금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할 때가 아니다. 격차는 이미 벌어졌고, 문은 닫히고 있다. 가용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2027년까지 이어질 '보릿고개'를 버틸 자원을 선점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