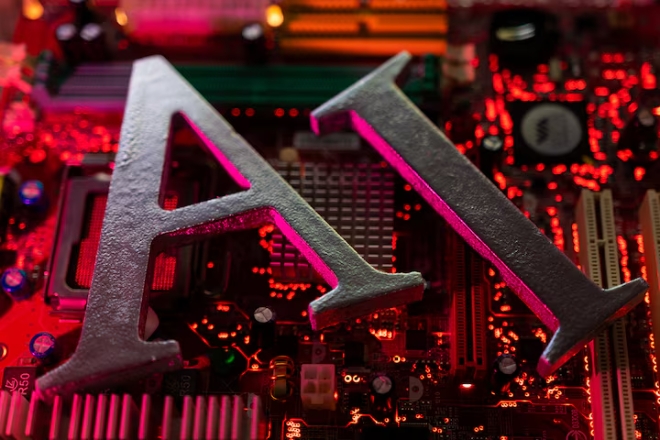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독일 주요 제조기업들이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멘스, 바스프, 폭스바겐 등 독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수십억 유로를 투입해 가상공장, 산업용 로봇, 스마트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섰는데 이는 미국·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로 평가된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도이체벨레는 “독일이 산업 박물관이 되지 않으려면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업계 경고도 전했다.
◇ “슈퍼컴퓨터 ‘주피터’ 가동…따라잡을 기회는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챗GPT와 딥시크 같은 대형 언어모델, 고성능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안정성 실험 등에서 이미 성과를 내며 경쟁 우위를 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일 산업계는 “더 이상 실험만 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 속에 전면 도입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 실험은 충분했다…이젠 실제 공정으로
보쉬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생산 일정 최적화 실험을 시작했으며 폭스바겐과 지멘스는 AI 기반 ‘디지털 트윈’ 공장, 즉 공정을 가상으로 재현해 개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리스크와 조직 변화 부담으로 실제 현장 적용은 제한적이었다.
AI 전문가인 토마스 람게는 “여전히 많은 독일 기업들이 명확한 AI 전략과 전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며 “파일럿 테스트가 본격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 독일의 무기는 ‘생산 공정의 정밀함’과 중견기업 네트워크
독일은 완성차 기업과 부품업체를 잇는 정교한 공급망과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강소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일단 AI 도입이 확산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독일 경제부는 AI가 2026년부터 매년 실질 GDP 성장률을 최소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인재 부족·법규 불확실성…넘어야 할 산도 많아
독일 산업계는 AI 확산 과정에서 인재 부족과 고비용,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다. 브뤼셀 기반 싱크탱크 브뤼겔의 알렉상드르 멘돈사는 “독일은 기술·과학 부문에서 AI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이를 다룰 인력이 가장 부족한 EU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유럽연합 AI법은 ‘고위험군’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항이 많고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EU 집행위는 이 법의 본격 시행을 2027년 8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 자동차부터 소프트웨어까지…AI는 생존 조건
독일 자동차 업계는 이미 70% 이상이 AI를 생산 공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멘스는 프랑스 르그랑, 스위스 ABB,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함께 유럽 내 ‘데이터센터 4대 기업’으로서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을 맡고 있다.
SAP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생성형 AI 비서 ‘줄(Joule)’을 탑재해 전 세계 고객사를 대상으로 확장 중이고 알리안츠는 글로벌 리스크 분석과 보험사기 탐지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 생산성 1.5%P↑, GDP 5200억 달러↑ 가능성도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독일이 AI를 전방위로 도입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생산성이 1.5%포인트 증가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는 최대 4500억 유로(약 686조800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AI 기반 생산 공정 개선으로 공장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25%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람게는 “AI는 자동차 산업 생존에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산업 정책과 비용 구조, 기술 전략이 함께 바뀌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