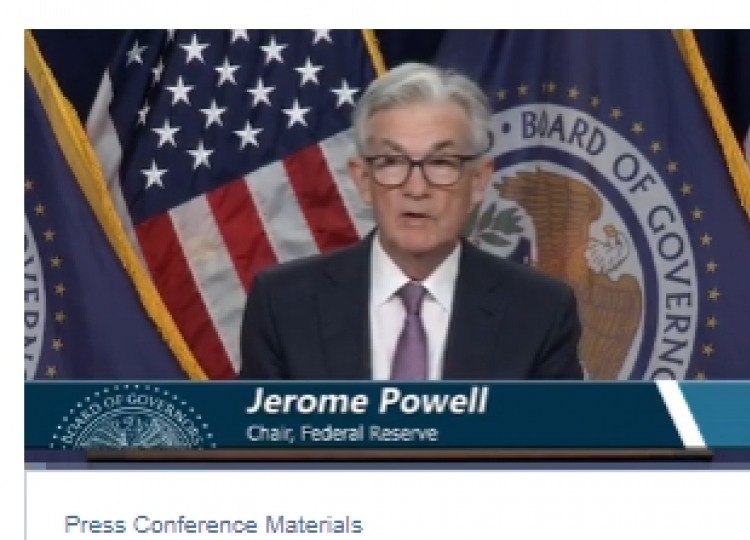1~10월 총수출 9776만 톤, 2024년 9205만 톤 초과…연간 사적 최고치 경신 전망
베트남·한국 규제로 감소, 중동·아프리카가 새 시장…일대일로 투자가 수요 견인
베트남·한국 규제로 감소, 중동·아프리카가 새 시장…일대일로 투자가 수요 견인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사우디아라비아가 2025년 핫한 목적지로 부상했다고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중국 세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 1~9월 사우디로의 철강 선적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주요 시장 중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철강 공장이 관세 인상과 반덤핑 조사로 2025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1~10월 전체 수출량은 9776만 톤으로 2024년 같은 기간 9205만 톤을 넘어섰으며, 연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궤도에 올랐다.
거대 이웃국으로부터의 금속 수입에 규제를 가한 베트남과 한국은 물량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지만 중국의 상위 2대 시장으로 남아 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는 강력한 성장이 있었으며, 중동과 어느 정도 아프리카가 수요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해외 투자, 부분적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러한 소비의 대부분의 토대를 마련했다.
우드 매켄지의 선임 연구 분석가 징 장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베이징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지출은 총 86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그 돈의 대부분은 에너지 및 운송과 같은 철강 집약적 부문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녀는 "중국 철강 수출 경로가 중동과 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품 믹스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며 인프라에서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철강 튜브와 장재 수출이 이미 작년 총량을 초과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사우디로의 장재 수출은 전년 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반제품 철강 선적은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된 수요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우디는 홍해의 네옴이라는 미래 도시에 대한 5000억 달러 계획에서 물러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첨단 제조와 같은 분야에 더 집중하고 있다.
전체 수출 수치보다 늦게 나오는 국가별 데이터는 제한이 적은 시장으로의 철강 수출 경로 변경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밝혔다.
중국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거나 계획 중인 국가들이 올해 1~9월 수출의 약 45%를 차지했는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54%에서 감소한 것이라고 BI는 밝혔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철강 수출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긴장이 끓어오르고 국내 수요가 여전히 약한 상황에서, 선적 붐의 지속 가능성은 중동이 얼마나 오래 기꺼이 구매자로 남아 있고 동남아시아가 강력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중국 철강의 사우디 집중은 전략적 전환이다. 규제 강화로 기존 시장을 잃자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베트남·한국 등의 반덤핑 규제를 우회해 사우디로 수출을 집중하고 있다"며 "41% 증가는 의도적인 시장 다변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연간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은 놀랍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도 수출이 늘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무역 규제가 강화되는데도 중국 철강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과잉 생산의 해외 전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 투자가 수요를 창출했다. 860억 달러 투자가 철강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동에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자국 철강 판로를 확보했다"며 "일대일로가 철강 수출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장재·반제품 급증은 인프라 투자를 반영한다. 사우디 건설 붐이 중국 철강을 빨아들이고 있다.
업계는 "장재 2배, 반제품 6배 증가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의미한다"며 "네옴 같은 메가 프로젝트가 수요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네옴 축소는 우려 요인이다. 5000억 달러 계획 후퇴로 향후 수요 지속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네옴에서 물러나고 AI·첨단제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철강 집약적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 국가 비중 감소는 전략 변화를 보여준다. 54%에서 45%로 줄며 규제 회피 성공하고 있다.
업계는 "중국이 규제 적은 시장으로 재빠르게 수출 경로를 바꾸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 지속성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동남아 성장 의존은 위험하다. 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의 경제 성장률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경제가 둔화되면 중국 철강 수출도 타격받을 것"이라며 "과도한 수출 의존이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과잉 생산의 글로벌 전가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 수요 부족을 수출로 메우는 구조다.
업계는 "중국이 국내 부동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해외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며 "글로벌 철강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철강의 중동 전환은 단기 해법일 뿐"이라며 "근본적으로 과잉 생산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