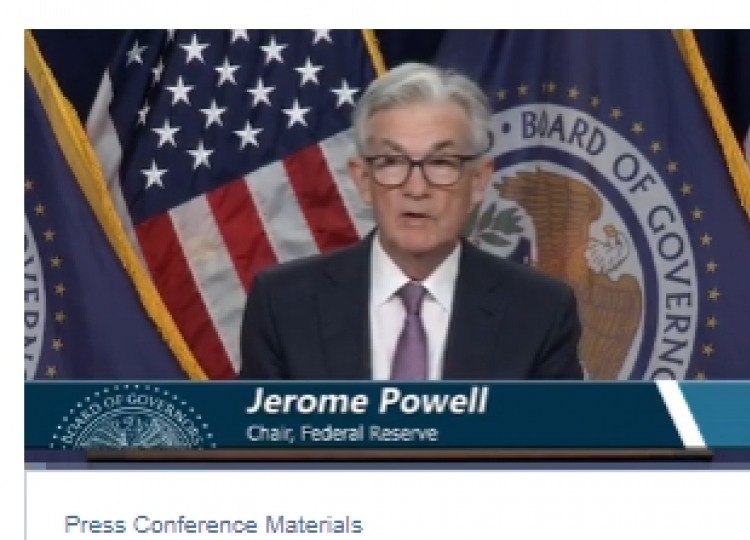8년간 美 자산 627% 폭증…157조 원으로 중국·베트남 첫 추월
IRA·반도체법 유인책 주효…배터리·전기차·AI 반도체 투자 집중
IRA·반도체법 유인책 주효…배터리·전기차·AI 반도체 투자 집중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3일(현지시각) 디지타임스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해외 생산 자산은 2016년 209조2000억 원에서 2024년 말 490조7000억 원으로 약 134.6% 늘었다. 이 중 미국 내 자산 비중이 크게 상승하며,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제공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전통적인 저비용 노동 시장 대신 미국 본토를 핵심 제조 중심지로 선택한 결과다.
기업분석 전문기관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기업의 미국 내 생산 자산은 2024년 말 기준 157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116조6000억 원)과 베트남(52조1000억 원)을 모두 합친 것(168조7000억 원)에 육박하며, 개별 국가로는 이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8년간 627% 폭증한 美 자산…'미국 우선주의'가 판도 바꿔
이러한 변화는 10대 그룹의 전체 해외 자산 추이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들의 해외 생산 자산 총액은 2016년 209조2000억 원(약 1462억7000만 달러)에서 2024년 말 490조7000억 원으로 134.6%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자산 변동은 격동 그 자체였다. 과거 1, 2위 생산기지였던 중국과 베트남을 대신해 3위에 머물렀던 미국이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다. 2016년 대비 미국 기반 자산은 무려 627% 폭증하며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美 우선주의'·IRA가 이끈 전략적 U턴
이 같은 전략적 이전의 배경에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이후 '미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추진한 제조업 부흥정책이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발효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강력히 유인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부문에서 국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과 정확히 일치하며 상호 이익이 맞물린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을 넘어, 미국 내에서의 R&D, 조립, 부품 현지조달체계를 포함한 통합형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유럽도 배터리 거점 급부상…쏠림 현상은 심화
한편, 아시아를 넘어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동시에 감지됐다. 주요 배터리 공장을 유치한 헝가리, 폴란드, 독일 3국의 자산은 2016년 대비 각각 975.3%, 733.5%, 780.7%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이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헝가리·폴란드 공장을 대규모로 확장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유럽연합(EU)의 녹색산업정책(Green Deal)과 현지화 장려가 동반 영향을 미쳤다.
삼성·SK·LG·현대 '빅4', 美 투자 95% 장악
미국 투자를 주도하는 것은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 이른바 '빅4' 그룹이다.
개별 기업 중에서는 삼성그룹이 43조2000억 원(302억1000만 달러)의 미국 생산 자산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SK그룹이 40조 원(279억7000만 달러)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았으며, LG그룹(38조8000억 원, 271억3000만 달러)과 현대자동차그룹(28조4000억 원, 198억6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4개 대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10대 그룹 전체 미국 생산 자산의 95.4%를 차지, 미국 내 투자 역시 소수 상위 그룹에 압도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 자산 증가액 면에서는 SK그룹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졌다. SK그룹은 2016년 대비 약 39조6000억 원(276억9000만 달러)이 급증하며 9162.9%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 삼성그룹의 자산 증가액인 37조8000억 원(264억3000만 달러)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확장은 미국 내 전기차(EV) 및 인공지능(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견인했다. SK그룹의 투자 급증은 주로 SK온의 배터리 합작법인(JV) 및 조지아주 공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삼성의 자산 증가는 주로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 및 테일러 신규 팹, 신규 배터리 사업 덕분이다. LG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의 미국 생산시설을,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전기차 전용 공장과 미국 내 조립라인을 중심으로 자산을 확대했다. 미국 시장 내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설비 투자 확대 역시 주요 동력이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해외 생산 자산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의 전체 해외 자산 중 상위 4개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6.5%에서 2024년 90.5%로 더욱 높아졌다. 한국의 해외투자 역시 대기업 중심의 초집중 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구도는 앞으로 대미(對美) 공급망 재편에서도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이 사실상 산업·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