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재정건전성 '경고등'…수급 불균형 심화
미국 '관세 수입' 법적 리스크 부상…시장 불안 가중
미국 '관세 수입' 법적 리스크 부상…시장 불안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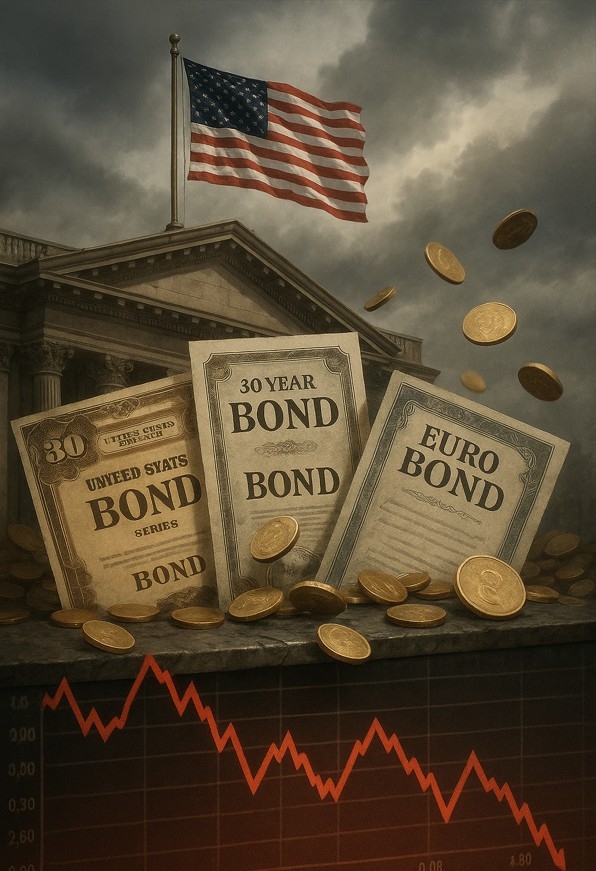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3일(현지시각) 배런스에 따르면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5.69%로 마감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30년물 금리도 각각 3.4%, 3.57%를 기록하며 2011년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프랑스 30년물 금리는 4.49%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일본 30년물 금리는 지난주 급등 후 소폭 진정됐으나 여전히 3.206%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 최대 채권 시장인 미국에서는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4.997%까지 오르며 2006년 이후 거의 넘지 못했던 5% 선을 위협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존 채권 투자자들은 대규모 평가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정치 불안·수급 불균형이 부른 '퍼펙트 스톰'
세계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한 데에는 복합적인 악재가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재정 지출 급증과 미국의 부유층 감세는 각국 정부의 부채 증가 우려를 키웠고, 프랑스·영국·일본의 정치 불안은 정부의 부채 관리 능력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오는 8일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한 의회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있어 정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다.
도이체방크의 짐 리드 글로벌 경제·테마 리서치 총괄은 "투자자들은 정치 마비가 심화하면 긴축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의 현재 재정 적자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악재가 쌓이고 있다. 전통 '큰 손'이었던 연기금과 중앙은행들의 수요 이탈 현상이 뚜렷하다. 일본은행(BOJ)은 물론, 세계 최대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장기 국채 보유액은 양적긴축(QT) 영향으로 2022년 4조9000억 달러(약 6825조 원)에서 현재 3조6000억 달러(약 5014조 원)로 급감했다.
뱅가드의 로저 할람 글로벌 금리 총괄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은 늘어난 반면,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초장기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절 요인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9월은 전통적으로 장기 채권 약세의 달로 꼽힌다. 실제 주요국 국채를 담는 아이셰어즈 국제 국채 ETF(IGOV)는 지난 10년간 9월 평균 1.46% 손실을 기록했으며,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만기 미국 국채 ETF(TLT)는 평균 2.6% 하락했다.
◇ '재정 방패' 기대했던 美 관세, 최대 복병으로
미국에서는 재정 적자 우려를 키우는 '관세 변수'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1조7000억 달러(약 2368조 원)로 전망되지만,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상당수 관세가 위법이라는 5월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관세 수입이 줄거나, 최악의 경우 이미 걷은 세금을 환급해야 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냇얼라이언스 증권의 앤드루 브레너 국제 채권 총괄은 "관세 수입이 줄어들거나 환급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적자가 늘어나고, 이는 장기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관세 수입은 944억 달러(약 131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40억 달러)보다 급증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관세가 2035년까지 적자를 4조 달러(약 5572조 원) 줄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의 효과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제임스 루시어 애널리스트는 "관세 수입이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는 좋지만, 대부분 관세는 8월 7일에야 발효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기업 비용을 늘려 오히려 소득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주 발표된 견조한 미국 소비 지출 데이터 역시 안전자산인 국채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기며 국채 금리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특정 국가의 문제를 넘어, 세계 주요국의 재정 운용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각국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