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해마다 입춘이 되면 사람들은 건강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하는 입춘첩을 써서 대문이나 기둥에 붙인다. 입춘첩을 붙이는 것은 우리 고유문화로 과거 궁중에서 설날에 문신들이 지어 올린 새해를 축하하는 시문(詩文) 가운데 뛰어난 것을 가려 대궐의 기둥에 붙였던 데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입춘첩의 글귀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인데 이 글귀의 주인공은 조선시대 예송 논쟁의 맞수였던 미수 허목과 우암 송시열이라고 한다. 숙종이 미수 허목에게 글을 청하자 ‘입춘대길’이라 썼고, 뒤이어 우암 송시열이 ‘건양다경’이라 지어 올렸다고 한다.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한나절 햇볕 다정해 보인다고/ 눈 뜨지 마/ 아직!/ 칼바람 강추위 물리친/ 봄바람 입맞춤 아니면/ 절대 눈 뜨지 마/ 내 새끼 같은 버들강아지야” 김수복 시인의 시 ‘입춘’이다. 시인의 말 대로 아직은 눈뜰 때가 아니다. 24절기가 시작되는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때라기보다는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춘하추동 사계절을 나누고 각 계절을 여섯 등분한 날들이기 때문이다. 입춘이 곧 봄이 아니라는 건 뒤에 오는 다른 절기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눈이 녹기 시작한다는 우수(雨水)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驚蟄)도 보름이나 한 달 뒤에 있다. 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기에 입춘은 마음속에 봄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입춘 무렵이라 해도 북한산은 밤새 내린 백설에 덮여 있고, 뺨을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맵차기만 하다. 꽃을 찾아 나서기엔 아직은 이른 한겨울 속이라 눈꽃 구경이라도 할까 싶어 북한산을 올랐다. 해가 바뀐 뒤 첫 산행이다. 눈이 내린 뒤라 아이젠을 챙겼으나 날씨가 추운 탓인지 길은 생각보다 미끄럽지 않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 밟히는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한다. 혼자 산을 오르다 보면 때로는 심심하단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눈길에선 그런 생각 할 틈도 없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가는 넘어져 다치기 쉽기 때문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일이 마치 바둑판에 돌을 놓는 것처럼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걷다가 지치면 잠시 다리쉼을 하며 흰 눈을 쓰고 있는 산을 바라본다. 늘 바라보던 산인데도 낯설고 신선하다.
어렵사리 백운대 정상에 올라 인증샷을 찍었다. 산에 오를 때마다 나는 조선의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홍길주의 말을 떠올리곤 한다. 그는 “사람의 일용기거(日用起居)와 보고 듣고 하는 일이 진실로 천하의 지극한 문장이 아님이 없다”라고 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꼭 문자로 된 종이책을 읽는 것만 독서가 아니다. 삼라만상이 모두 책이고, 삶이 곧 독서인 셈이다. 응달진 계곡엔 눈이 쌓여 있고 계곡물은 얼어붙어 고드름을 발처럼 드리웠는데 햇살 바른 양지쪽엔 어느새 눈이 다 녹았다. 시절이 어수선해도 계절의 차례만큼 어긋나지 않는 것은 없다. 세상이 눈에 덮여도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을 알기에 나는 기다릴 것이다. 꽃 피는 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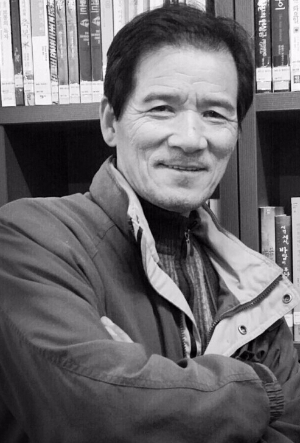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