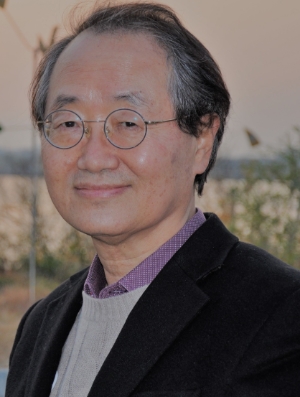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요즘 요리사가 학생들의 희망 직업 상위에 오른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요리사는 고단하게 몸을 쓰는 직업이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몸보다 정신을 귀하게 여겨왔다. 심신 이원론의 영향도 있겠지만, 몸 노동보다 정신 노동을 선호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요리사의 ‘몸’보다 철학자의 ‘정신’이 더 귀한 것인가? 요리사에겐 정신이 덜 중요하고, 철학자에겐 몸이 덜 중요한가? 과연 몸과 정신은 분리할 수 있는 건가?
안도현의 시, ‘스며드는 것’을 읽어보자. “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시인은 알을 품은 꽃게의 생명 상실을 염두에 두고 시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장이 꽃게에 스며들면서 게장이 되어가는, 그래서 간장게장으로 하나 되는, 심신 일원론적 관점도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의 제목에 배어있다. 게 없는 간장게장도, 간장 없는 간장게장도 존재할 수 없는 법. 이렇게 서서히 간장게장이 되어가는 것처럼, 요리사도 ‘철학하면서’ 삶에 다가가고, 철학자도 ‘밥하면서’ 삶에 다가가는 것 아닐까?
밥은 ‘쌀을 익힌 음식’이고, ‘밥하다’는 ‘쌀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여 익히는 행위’이다. 그러나 요리사가 ‘철학하면서’ 삶에 다가가는 것은 이런 차원을 넘는다. ‘밥하다’는 밥을 통해 생명과 행복을 ‘짓는’ 지혜를 찾는 행위이다. 마치 ‘철학하다’가 지혜를 찾는 행위인 것처럼.
밥할 때는 먼저 음식을 정하고, 만들고, 맛보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판단한다. 철학할 때에도 주제를 선정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한다. 두 과정이 아주 비슷하다. 게다가 ‘밥하다’와 ‘철학하다’의 재료는 둘 다 삶의 경험에서 얻는다. 밥은 실천에 중심이 있고, 철학은 생각에 중심이 있지만, 실천은 생각에서 오고, 생각은 실천을 향하지 않는가?
굳이 따지자면 ‘밥하다’가 ‘철학하다’보다 더 우선적이고 근원적이다. 소크라테스도 “빚진 닭 대신 갚아주게.” 이렇게 유언하지 않았던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보다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가 더 우선적이고 근원적이다. 생각은 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지만,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리사는 ‘밥하다’를 통해, 쓰든 달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철학하다’로 넘어간다. ‘방랑 식객’ 임지호 님, 그분이야말로 요리하는 철학자이자 철학하는 요리사 아니었던가?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요리사였다면 그의 철학이 삶의 지혜를 향해 더욱 깊어졌을 수 있다. 한마디로 ‘밥하다’가 ‘철학하다’이고, ‘철학하다’가 ‘밥하다’이다. 이것이 요리사를 희망 직업 상위에 놓는 참된 이유였으면 정말 좋겠다.
김석신 가톨릭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