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델, 美 경쟁사 대비 '저비용·고성능' 충격… "中, 美와 경쟁 가능"
디플레이션 등 3D 문제 해결 '기여 기대'… AI, 산업 혁신 견인 '국가 챔피언' 부상
디플레이션 등 3D 문제 해결 '기여 기대'… AI, 산업 혁신 견인 '국가 챔피언'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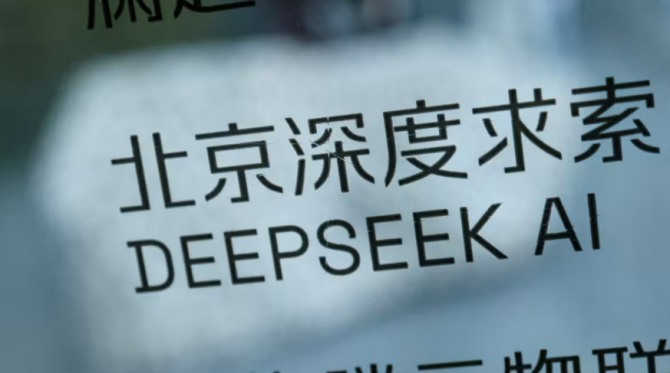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딥시크의 출현은 시장 심리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전반에 훨씬 더 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멋진 앱을 개발하는 것과는 달리, 강력한 하드웨어 기반의 AI 모델 개발은 기업가들의 야망이 완전히 다른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1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제 딥시크는 배터리 제조업체 CATL, 전기차 생산업체 BYD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국가 챔피언'으로 부상했다. JP모건의 조이스 창 리서치 책임자는 "딥시크의 출현은 중국 AI의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중국 기술 분야(AI, 산업용 로봇, 자동화)는 엔지니어링 인재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수십 년에 걸친 개발 끝에 획기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AI와 실물 경제의 통합은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딥시크가 촉진하는 AI의 광범위한 채택은 제조업 혁신, 스마트 제조, 자율 주행 자동차, 로봇 사용을 가속하여, 중국이 직면한 인구 통계(Demographics),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는 세 가지 골치 아픈 'D'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딥시크가 일회성 성공인지, 아니면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와 보다 관대한 규제 환경이 유리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의 돌파구를 예고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만약 딥시크가 AI 개발에 있어 '두둑한 주머니'보다 기술력과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이는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중국 시장이 연초 대비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상위 5개 시장 중 하나로 꼽히며(MSCI는 7월 10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5% 상승), 투자 심리가 크게 고무되었다.
지난 3월 말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의 분위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더 강력한 제재를 예상하며 우울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6월 마지막 주 톈진에서 열린 다보스 서머 포럼은 훨씬 더 낙관적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알리바바와 디디(Didi)와 같은 기업들과 수년간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베이징이 기술 기업가들을 더욱 설득력 있게 포용하기 시작한 덕분이다.
더욱이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에 모건 스탠리의 기술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선두가 좁혀졌다"고 진단했다.
그들은 "딥시크는 미국의 AI 지배력에 도전함으로써 전 세계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며 "과거에는 일본이 하드웨어에서, 인도가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에서 우월한 숙련도를 자랑할 수 있었고, 오직 미국만이 두 가지 기술 모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숙달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중국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딥시크는 중국이 자율 주행 자동차, 배터리 기술, 재생 에너지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 격차를 좁히는 동시에,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및 연구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출시되었다.
중국은 이미 드론과 같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되는 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이 기후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줄이는 동안, 중국은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핵융합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해결하려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딥시크의 성공은 어쩌면 덜 놀랄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모건스탠리 분석가가 지적했듯이, 딥시크는 인재, 저렴한 에너지,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중국 본토의 심층 생태계의 일부다.
중국 내에는 535개의 대학이 AI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며, AI 관련 특허를 어느 나라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 분야 최고 등급 연구원의 약 28%가 허페이(Hefei)와 정저우(Zhengzhou)에 위치한 두 개의 대학 센터에 재직 중이다.
인적 자본은 단순한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중국 밖에서는 딥시크의 배후에 민간 자본만이 있다는 상당한 회의론이 있었지만, 딥시크와 같은 퀀트 펀드의 현지 투자자들은 적어도 2년 전부터 딥시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다른 대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시장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하고 있다. 딥시크의 등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중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