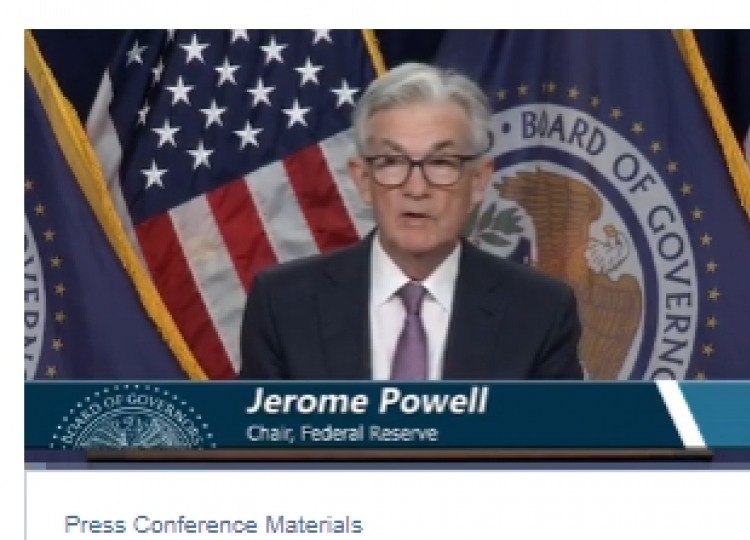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하우스 오픈 뒤, 관객 입장 시작 전까지 메인 막 앞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치된다. 클래식 튜튜(Classical Tutu)를 입고 몸의 모사로 존재한다. 로봇은 가끔 작은 움직임들을 보여주지만 인간 무용수와 다른 호흡의 미묘한 긴장감을 발산한다. 인간의 몸을 흉내 내려는 듯하지만, 인간의 움직임을 초월하려는 모사체(simulacrum)의 의지를 내비친다. 인간과는 다른 로봇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Simulacra World’를 선언한다. 원본과 복제의 구분이 상실되어 간다.
실재 몸과 재현된 신체가 부딪힌다. 로봇은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발리’라고 소개한다. 발리는 정밀한 반복성과 냉정한 리듬으로 ‘꿈’조차 복제됨을 암시된다. 발리는 춤의 진위를 물으면서 시뮬라크라적 신체상의 문제를 그려낸다. 실리콘 가면의 무용수와 대형 로봇(Be-BEE)이 마주 본다. LED 스크린에 ‘발리’가 거대하고 정교해진 형태로 등장한다. 로봇을 넘어, 미래의 발레리나로 이상화된 존재, ‘인간보다 더 완벽한 몸’의 하이퍼 사실적인 신체의 이미지다.
이 장면은, 무용의 미학이 ‘실재적 움직임’에서 ‘지각의 재현성’으로 이동하는 지점을 시각화한다. 무용수의 신체는 더 이상 움직임의 주체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적 신체성의 실험장으로 기능한다. ‘발리’와 ‘Be-BEE’, 인간 무용수는, 각각 원본, 복제, 초복제(hyper-replica)의 층위를 상징하며, 세 존재가 한 무대 안에서 서로의 실체를 질문한다. 이때 춤은 더 이상 육체의 예술이 아니라, 인식과 이미지가 교차하는 무의식적 사건으로 확장된다.
이 영상과 함께 무대 앞쪽에서는 따라 하는 로봇이라고 설명했던 Be-BEE 로봇이 실리콘 가면을 쓰고 앉아 있는 무용수(백연)를 따라 한다. 무대 전환과 함께 장면이 전환되고 역시 실리콘 가면을 쓴 번지 전문가(홍찬주)와 보통 인간처럼 보이는 남자 무용수(김유식)가 함께 춤을 이어간다. 번지의 움직임과 함께 역동적인 듀엣이 시작되고 직선적으로 디자인된 조명의 이미지와 어우러지면서 무용과 번지의 협업이 이어진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1장. ‘Replication and Transformation’ : 동일함의 반복 속의 차이를 생성하는 몸의 변주, 복제를 통해 탄생하는 하이브리드 몸의 미학을 시각화한다. 실리콘 가면의 다섯 무용수가 후 무대에서 전 무대로 이동하며 보여주는 미세한 관절의 떨림과 발레의 기계적 변형은 인공적 신체성을 드러낸다. 실리콘 가면과 유광의상의 남녀 아홉의 군무는 복제와 차이의 역동을 론도형식으로 풀어내며, 복제 인간의 생성 과정을 냉정하고 정밀한 기계의 언어로 형상화한다.
두 대의 로봇 개에도 실리콘 가면이 붙어있다. 로봇팔이 달린 4족 보행 로봇(Spot Arm), 바퀴가 달린 로봇(Go2 Wheel)이 레이저와 함께 춤추는 장면은, 더 이상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시뮬라크라적 무용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어 등장한 무용수들은 살색의 유광 타이즈와 검정 도베르만 로봇의 머리를 결합한 채, 인간과 기계, 동물의 경계가 해체된 신체의 분절과 결합을 통해 혼종적 신체(hybrid body)로 무대 위에 출현한다.
인간 머리에 로봇인 몸, 머리는 개이되 몸은 인간인 역전된 형상은, 신체의 탈-자연화에 걸친 복제와 변형의 미학을 시각적으로 완성한다. 발과 다리를 감싼 검정 장갑과 반 스타킹은 도베르만의 강인한 형상을 환기하며, 발레의 조형적 질서를 따라가면서도 그 선율을 기계적으로 절단한다. 이 장면은 몸의 진정성을 해체하고, 인간의 움직임이 동물성과 기계성으로 분절되는 순간-무용이 더 이상 인간만의 언어가 아님을 선언하는 미학적 전환점으로 작동한다.
네 팔을 가진 무용수의 등장과 LED 화면 속 변형된 신체 영상은 실재의 몸과 재현된 이미지가 서로를 침투하며 감각적 실재를 생성한다. 한 몸처럼 결합한 두 여성 무용수와 길게 늘어난 신체의 형상은, 인간의 비율과 형태에 대한 관습적 인식을 해체하고 몸의 구조를 조형적 재료로 전환한다. 손이 발이 되고, 몸이 늘어나며 시선을 응시하는 기묘한 피날레는 몸은 고정체가 아닌 생성 과정임을 드러내며 복제된 신체의 존재론적 불안을 미학적으로 표면화한다.
2장. ‘Mine vs Yours’ : 인간의 새로움의 욕망에 내재한 이기적 동기를 몸으로 들어내며, 창조와 소유, 윤리 사이의 불안한 경계를 탐문한다. 붉은 비닐을 끄는 남성 무용수와 돼지·소의 형상이 결합한 가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명 조작의 상징으로서 인간·동물·기계의 혼종적 신체를 형상화한다. 회전무대 속 비닐 안 무용수들과 LED 화면에 투사된 심장·장기의 이미지는 복제 생명의 물질성과 욕망이 맞닿은 지점을 시각적으로 폭로, 신체의 의미를 재정의한다.
9명의 무용수는 끼이고 들어가고 쌓이는 조형적 군무를 보인다. 타이밍에 따라 움직임의 다양한 모양을 완성하고 조합되는 모형에 따라 가면은 조형적 움직임 이미지의 전체 모양을 완성한다. 해체되는 군무 뒤에는 줄지어 로봇의 조형물이 내려온다. 후 무대에서 비추어지는 조명과 함께 로봇의 군대 같은 조형물들이 떠 있고 그 사이로 첫 장면의 무용수 두 명, 연구자 옷을 입은 무용수와 번지 무용수가 동일한 실리콘 가면을 착용하고 로봇과 함께 등장한다.
로봇이 인간을 따라 하던 이전 장면을 넘어 이 장면에서는 인간이 로봇의 뒤를 따르는 느낌이 펼쳐진다. 두 무용수의 듀엣이 이어지고, 남자 무용수 두 명의 듀엣이 이어진다. 장(場) 마지막에 로봇과 함께 등장한 두 무용수가 인간의 움직임을 로봇의 리듬에 맞추는 장면은 창조자와 인공적 존재물의 위계가 전복된 시대의 ‘윤리적 무용’, ‘누가 누구를 움직이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으로 귀결된다. 안무가는 현재의 춤이 미래에도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를 사유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3장. ‘Realized Body vs Disappearing Original’ : 존재의 전복과 신체의 재현 미학을 사유한다. ‘새롭게 실현된 몸’과 ‘사라지는 원형의 몸’ 사이의 미묘한 전이를 다룬다. 금속성 장갑으로 상징화된 두 남성 무용수의 듀엣은 ‘붙잡은 손’이라는 접촉의 은유를 통해 자기 동일성의 마지막 흔적을 보여준다. 그러나 손이 떨어지는 순간, 동일성은 분열되고, 복제된 몸은 원형을 전복하며 ‘진짜의 자리’를 탈취하는 존재론적 반전을 수행한다.
이후 상하 레벨의 대비는 권력의 위계이자 실존의 질서를 시각화한다. 낮은 레벨의 무용수는 ‘패배한 원형’으로 내던져지고, 높은 레벨의 무용수는 새로운 정체성의 획득자처럼 부상한다. 원형인 듯한 무용수는 존재의 전복을 맞이하는 듯 바닥에 쓰러진다. 이어 무용수는 머리, 다리, 손, 팔 등의 신체를 떨며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쓰러진 신체의 경련과 떨림은 분열된 육체의 아우성, 즉 자기로부터 밀려난 신체의 언어다.
바흐의 토카타(Toccata)가 편곡된 불안정한 선율 속에서 2인무와 군무는 증식하는 몸들의 소란을 그리며, LED로 조각된 이미지들은 복제된 신체의 전자적 환영을 확장한다. 마지막에 이르러 ‘원형’으로 보이는 무용수가 한 팔을 선택하는 장면은 존재 선택의 역설을 제기한다. 원래의 팔과 새로운 팔, 어느 쪽이 진짜인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질문은 결국 신체를 ‘존재의 근거’가 아닌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현전(現前)’으로 드러낸다.
에필로그. ‘The Contemporary Body, and Recovery’ : 분열 이후의 몸, 회복의 미학, 해체된 군무 속 ‘원형의 인간’과 대형 로봇 Be-BEE와의 대면은, 인간과 기술, 유기체와 기계가 마주 선 동시대 존재의 초상이다. 로봇의 렌즈가 인간의 몸을 기록하고, 그 기록이 곧 새로운 이미지로 변환되는 과정은 ‘재현된 몸’이 다시 ‘춤추는 몸’으로 회귀하는 미디어적 순환을 제시한다. 무용수의 움직임은 파편화된 존재를 끌어안는 동시대적 수용의 몸짓이다.
안무가는 ‘인간의 원형’인 동시대의 몸이 가장 존귀한 형상의 몸임을 선언한다. 미래의 시선 아래 잠시 머무는 하나의 현전(現前), 개념 자체에 대한 미학적 사유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몸을 절대적 원형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미래의 시선 속에서 오늘의 인간이 또 다른 ‘자연인 1기’로 분류되거나 완전히 잊힐 가능성까지 품고 있다. ‘자연’의 재현이 아니라, 이미 기술과 매체에 의해 구성된 ‘인위적 자연’—즉, 동시대적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안무가는 덧없음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존엄’을 발견한다.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았던 옛 몸을 애도하되, 기술과의 공존 속에서 다시 ‘인간다운 몸’을 회복하려 한다. 회복이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분열된 몸들을 스스로 봉합하는 윤리적 행위로 전환된다. 백연 안무의 '바디-시뮬라크르'(BODY SIMULACRA)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독창적 주제 선정, 잘 짜인 구성, 첨단을 일깨워주는 로봇 동원, 안무에 걸맞은 연기력에 걸친 수범의 창작 발레 공연이 되었다.
장석용 문화전문위원(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