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약 8% 성장…일부 지역 사실상 ‘개점휴업’
단일 영업구역에 묶여 영업 기반 확대 어려워
업체별 자산 규모와 영업 역량 격차 뚜렷
단일 영업구역에 묶여 영업 기반 확대 어려워
업체별 자산 규모와 영업 역량 격차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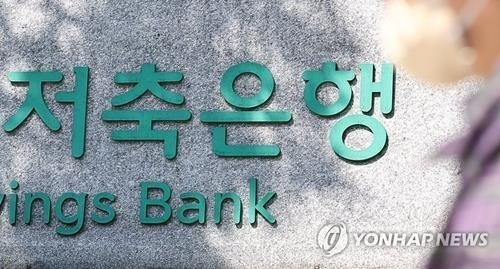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수도권 저축은행은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유리하지만, 단일 영업구역에 묶인 지방 저축은행은 지역 내 대출 수요가 줄면 외부로 진출조차 어렵다. 여기에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방 저축은행들은 서민 자금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울·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가계대출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무려 41곳(52%)이 지난 4년간 가계대출을 꾸준히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2020년 20조3900억 원에서 2024년 27조6700억 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한 반면, 대구·경북·강원권은 같은 기간 –0.9%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전북·제주권 역시 1%대 성장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업계 전체 대출 잔액이 늘었음에도 증가분의 4분의 3 이상이 서울에서만 발생하는 등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2020년 1.45조 원에서 2024년 2.74조 원으로 약 88.7%(1.29조 원) 급증했고, 애큐온저축은행도 1.13조 원에서 2.27조 원으로 100.6%(1.14조 원) 확대됐다. 신한저축은행은 1.14조 원에서 2.02조 원으로 78.2%(약 0.89조 원), 다올저축은행은 1.37조 원에서 2.02조 원으로 47.3% 늘었다. 하나저축은행은 6232억 원에서 1.16조 원으로 약 5391억 원(86.5%) 증가했고, 키움저축은행도 4739억 원에서 7927억 원으로 67.3%(3188억 원) 늘어나 수도권 중심의 외형 확대 흐름을 뚜렷이 보여줬다.
반면 지방 저축은행 사정은 처참하다. 부산·경남권의 동원제일저축은행은 2020년 3069억 원에서 2024년 1127억 원으로 63% 이상 줄었고, 같은 권역의 진주저축은행도 1486억 원에서 1185억 원으로 20% 넘게 감소했다. 대구·경북·강원권의 참저축은행은 1839억 원에서 654억 원으로 64% 줄었으며, 엠에스상호저축은행도 2043억 원에서 1132억 원으로 45% 가까이 감소했다.
대전·충남·충북권에서는 아산저축은행이 479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70% 이상 줄었고, 한성저축은행과 대명상호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도 각각 20~30%대 감소세를 보였다. 광주·전남·전북·제주권의 동양저축은행도 1726억 원에서 1372억 원으로 20% 넘게 줄며 지역 금융 공급 축소 흐름을 드러냈다. 부산권의 에스앤티저축은행은 감소율이 무려 90%에 달해 사실상 영업 기반이 무너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단순히 지역 경기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자산 규모와 영업 역량의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수도권 저축은행은 규제 비율 충족이 유리하지만, 단일 영업구역만 보유한 지방 저축은행은 지역 내 대출 수요가 줄면 외부 시장에 진출하기도 어려운 구조적 제약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규모가 작은 지방 저축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조차 갖추지 못해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부동산 PF와 기업대출로 영업을 메우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