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 프로젝트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21세기 해양패권 경쟁 새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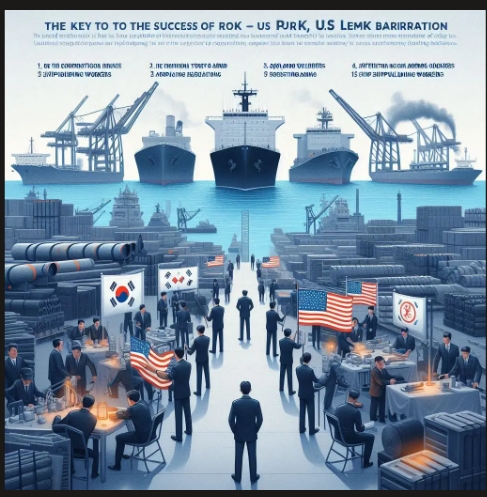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가 '조선산업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중국 독주 vs 한국 효율성…새로운 균형점 모색
글로벌 조선업계 경쟁구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53%, 한국이 17~28%, 일본이 10~12%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2024년 신규 수주에서 67%를 점유해 한일 조선소 합계(42%)를 크게 초과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Military-Civil Fusion' 전략과 국가 보조금을 통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며 조선업계를 장악해가고 있다. 2024년 상선 수출 규모만 430억 달러(약 60조3600억 원)을 기록했으며, 동맹국들도 중국 1급 조선소에서 305척을 구매(2019~2024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미 협력을 통해 미국-한국-일본 조선동맹 구조가 형성되면서 중국 견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62% 대 중국 38%로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한국, 일본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의 대량생산 기술, 일본의 정밀 엔지니어링, 미국의 첨단 기술이 통합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존스법·ITAR 규제 완화…법적 기반 마련 '핵심'
한미 조선협력 성공의 관건은 법적 장벽 해소다. 미국의 존스법(Jones Act)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각종 규제가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8년 한미정상 간 구두합의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획득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의 2등급 지위를 부여받았다. 대외군사판매(FMS) 프로그램에서 주요방산장비 2500만 달러(약 350억 원) 이상, 일반 방산물자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 시 의회 통보 의무(15일 대기 기간)이 적용된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조선업 협력을 위한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군 준비태새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는 해군 함정 건조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통과로 외국 투자가 장려되고, 백악관 조선업무소 신설도 예정돼 있다.
스팀슨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해군 조선협력을 위한 항로점과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존스법 등에 대한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협력의 제약 요인이다. 미국은 용접공 33만 명, 전체 조선인력 40만 명이 부족하고, 한국도 조선업계 1만 4000명 부족, 향후 4만 5000명 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를 통한 E-4 비자 확대와 한국 조선기술자의 미국 파견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미 조선협력이 성공할 경우 글로벌 조선업계 재편과 함께 한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해양패권 유지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해상 공급망 안보 강화라는 다중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