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마음속에 봄을 들이던 입춘도 지나고 남녘에선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도 간간이 날아오는데 내가 사는 이곳엔 여전히 겨울이 깊다. 산책길에 꽃나무 가지에 눈길을 주어봐도 어디에도 봄빛이 스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가로변의 벚나무들도 여전히 겨울잠에 취해 있는 듯 물을 길어 올리는 기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좀 더 일찍 꽃을 볼 욕심으로 꽃나무 가지를 꺾어 화병에 꽂을까 생각하며 개나리 울타리를 서성이다가 꽃 피지 않는 나무라도 해거리 중일지 모르니 함부로 꺾지 말라던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빈손으로 돌아섰다. 봄을 생각하면 까닭도 없이 자꾸만 달뜨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엔 시만 한 것도 없다.
“꽃으로 화창하던 날 교만하지 않았고/ 찬 바람 몰아치는 날 비굴하지 않았다/ 오늘 담담할 수 있어야/ 내일 당당할 수 있다/ 꽃을 박탈당했다고 말하는 꽃나무는 없다/ 꽃잎을 내려놓았다 말하지 않느냐/ 그 차이는 크다/ 빈 몸으로 서서/ 겨울 벚나무는 그렇게 말한다/ 단 한 나무도 아우성치지 않는다/ 견디는 것과/ 초조해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나무들은 안다고/ 어떤 나무가 동요하느냐고” -도종환의 시 ‘겨울 벚나무’ 전문이다. ‘오늘 담담해야 내일 당당할 수 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조급함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억지로 꽃을 피울 수는 없다. 동요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 겨울 벚나무의 인내가 봄을 끌어당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산책을 나설 때마다 나는 곧잘 집에서 멀지 않은 ‘방학동 은행나무’를 찾아가곤 한다. 서울에서 수령이 가장 오래된 그 은행나무 주위를 탑돌이 하듯 몇 바퀴 돌고 나면 어느새 복잡하던 생각도 맑아지고 마음도 고요해진다. 기다려도 봄은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온다. 이제 대동강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면 겨우내 잠들었던 산천에도 서서히 봄빛이 닿을 것이다. 그리고 비 한 차례 지나고 나면 대지는 겨우내 묵혀 두었던 시름을 한껏 풀어내며 얼었던 땅을 뚫고 초록 새싹을 지상으로 밀어 올릴 것이다. 조급함을 버리고 담담하게 기다리면 뒤 강물이 앞 강물을 밀고 가듯이 봄은 겨울을 밀어내며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다.
나이 듦이 좋은 이유 중의 하나는 행동이 느려진다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남녘에서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가기도 하고 복수초나 바람꽃을 찾아 눈 덮인 산속을 떠돌기도 했겠지만 이젠 일부러 꽃을 찾아 나서지는 않는다. 그만큼 몸이 굼떠진 까닭도 있겠지만 나이 들면서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생긴 덕분이 아닐까 싶다. 먼 곳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둬들이고 내 앞에 놓인 삶에 눈을 맞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소소한 일상의 변화를 찬찬히 읽다 보면 예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
맵찬 북풍에 외기가 냉랭해도 봄은 멀지 않다. 해마다 봄은 찾아오겠지만 유한한 목숨을 지닌 우리에게 봄은 영원하지 않다. 내게 몇 번의 봄이 남아 있을까 생각하면 목을 길게 빼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봄을 맞이하기 위한 채비를 단단히 하는 게 오는 봄에 대한 제대로 된 환대가 아닐까 싶다. 헤르만 헤세는 ‘봄의 말’을 이렇게 남겨 놓았다.
“어느 소년 소녀들이나 알고 있다/ 봄이 말하는 것을,/ 살아라, 자라나라, 피어나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움트게 하라./ 몸을 던져 두려워하지 마라!// 노인들은 모두 봄이 소곤거리는 것을 알아듣는다/ 노인이여, 땅속에 묻혀라/ 씩씩한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몸을 내던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두에게 희망이 넘치는 찬란한 봄이 곧 시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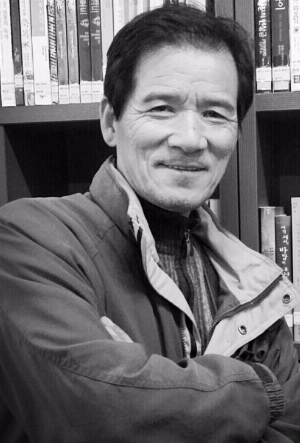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