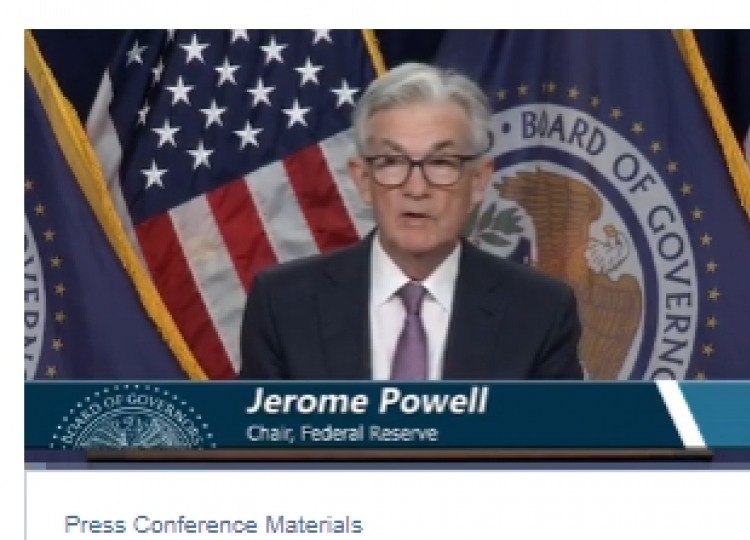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광릉은 학창 시절 자주 소풍을 다녔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 사는 곳에서도 멀지 않아 자주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수목원과 광릉 외에도 여름에 연꽃을 볼 수 있는 봉선사까지 있어 드라이브하기에도 좋고, 잠시 차를 내려 숲 사이로 난 데크 길을 따라 걷기에도 좋다. 내게 광릉 숲길은 딱히 무엇을 하기 위해 찾는 장소라기보단 마음이 심란하거나 무료하다 싶을 때 무작정 찾아가는 나만의 도피처이자 쉼터와 같은 곳이다.
봉선사 연꽃 방죽을 돌며 연꽃 향기에 그을리고 오랜만에 광릉을 산책했다. 수목원과 봉선사는 가끔 찾았지만 광릉은 매번 스쳐 지나곤 했다. 능으로 오르기 전, 재실 앞에 보라색 벌개미취가 군락을 이루어 피어 있었다.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꽃이 벌개미취다. 벌개미취 꽃대 사이에 매미 허물이 매달려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러고 보니 숲에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다. 7년이란 긴 시간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이제야 허물을 벗고 날개를 얻었으니 매미도 한 번쯤은 세상을 향해 크게 소리치고 싶었겠다 싶다. 능을 오르는 길섶에 쓰러진 전나무 고목이 누워 있다. 2010년 곤파스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라고 한다. 쓰러진 고목 위엔 이름 모를 버섯이 피어 있고, 쓰러져 누운 세월만큼 단단하던 몸도 사위어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다음은 그 쓰러진 나무를 보며 지은 시다.
“직립의 나무들이 초록 그늘 드리운/ 왕릉 오르는 길/ 태풍에 쓰러져 누운 나무를 본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키운 몸집/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동안/ 벌레의 집이 되고 버섯의 삶터가 되어주는/ 쓰러진 나무// 이 한 몸/ 저 나무처럼 쓰러져/ 어느 길섶에 누우면/ 내 생의 길도 사라지고/ 내가 품고 온 이야기도 끝이 나겠지 싶은데// 그래도/ 살아 있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면/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생이라고/ 위로하듯 쓰러진 나무가 푸른 향기로 속삭인다.”-졸시 ‘쓰러진 나무’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조선의 7대 왕인 세조와 왕비 정희왕후가 잠들어 있는 광릉은 능으로 오르는 완만한 숲길이 특히 아름답다. 길 양옆으로 울울창창한 전나무와 활엽수들이 어우러져 초록 그늘을 드리운 덕분에 걷기에도 좋고 풍경 또한 일품이다. 바람 한 점 느낄 수 없는 꽉 막힌 도심의 답답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서 이 세상이 이 세상 같지 않다. 흙길을 밟아 천천히 걷다 보면 자연스레 생각은 깊어지고 가지런해진다. 숲길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사색의 공간이자 언제나 자신만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최고의 사유의 공간이란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
왕릉을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에 벌개미취 위를 나는 호랑나비 한 마리를 보았다. 꽃 위를 날았다 앉기를 거듭하며 꿀을 빠는 호랑나비는 나의 눈길이 부담스러웠는지 이내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커다란 날개를 나풀거리며 날아간 호랑나비가 그러하고, 예쁜 꽃들과 매미도 한 철을 넘기지 못한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더위에 지쳐 힘겨운 여름이라 해도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게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야 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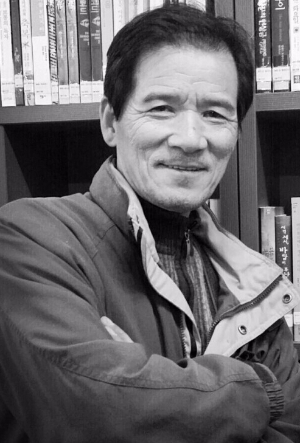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