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문으로 읽는 21세기 도덕경' 제35장

가난해서 굶는 이도 없고 권력 명예 이익을 두고 다투지 않는 데다 가정불화도 없고 전쟁도 없다. 오직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생활하니 천지가 합일하여 감로수가 내리듯 천하가 태평하다. 천상에서 축복의 꽃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펼쳐진 지상낙원을 바라보는 듯 상상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다.
노자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꿈에 젖어 살았을까? 이와 같이 말했다. 대도를 지키면서 천하를 다니면 어디를 가든 해를 입지 않으며 평안하다. 즐거운 노래와 맛있는 음식이 나그네 발길을 멈추게 하니 도로써 나아가는 곳에는 음식 맛이 담백하다. 보아도 부족하게 보이고 들어도 부족하게 들리기만 하다. 도의 쓰임새는 아무리 써도 또 써도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모자라지 않고 쓰인다. 도의 쓰임새는 대도로부터 펼쳐진다.
대도를 상이라 한 것은, 도와 상은 다르지 않아서 존재는 하되 모양과 색깔이 없어서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공기가 차면 추위를 느끼고 더우면 더위를 느낀다. 공기란 텅 빈 공 간에 가득한 기(氣)라는 에너지이며, 에너지의 미세한 알맹이를 씨라 하고 매일매일의 씨를 날씨라 한다. 그래서 씨가 차가우면 날씨가 차다고 하고 습하면 날씨가 습하다고 한다. 우리는 차고 덥고 습한 날의 씨(氣)를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존재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함으로 이것을 상이라 하며 상의 근본이자 쓰임새를 대도라고도 한다.
동양의학에서는 한(寒 추위), 풍(風 봄바람), 습(濕 습기), 서(暑 더위), 조(燥 열기), 건(乾 건조) 등 여섯 가지 날씨를 도라 한다. 여섯 가지 날씨가 바로 만물을 탄생시키고 길러주고 또 거두어 가는 실질적인 대도의 쓰임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쓰임새를 상이라 하거니와 대도 자체라 할 것이다. 그 상과 대도는 마치 대지를 적셔서 만물을 낳고 길러주는 강물과 골짜기 물이 다르지 않은 것과 같다.
그리고 상이란 문자는 볼 수가 없으나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대도가 그러하다. 도가 천하에 두루 넘쳐나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늘 대도와 함께하고 있다. 숨 쉬고 감각되는 공기(空氣 에너지)가 바로 상이자 대도이다. 따라서 대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득히 차고 넘치게, 그리고 쉼 없이 온 천하에 빠짐없이 두루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온갖 생명이 천하를 나다니며 도에 의해 나고 자란 갖가지 먹을거리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
하지만 뭇 무리는 갖가지 음식을 먹고 마실 뿐 도의 담박한 맛을 음미할 줄 모른다고 하였다. 도의 담박한 맛을 모른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중용을 잃음으로써 도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삶의 은덕을 제 잘난 덕이라고만 생각한다. 도가 면면히 뿜어내는 기운을 단 몇 분만 숨으로 들이쉬지 않아도 죽음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도의 쓰임새인 상을 보고 또 보아도 볼 수 없으니 없는 것 같고, 듣고 또 들어도 들을 수 없으니 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도가 베푸는 덕의 고마운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에 벗어나고, 도덕에 벗어나므로 천하를 다닐 때 해를 입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은 도와 같아져서 덕을 베풀 것이며, 덕을 베푸는 사람은 천하 어디를 가든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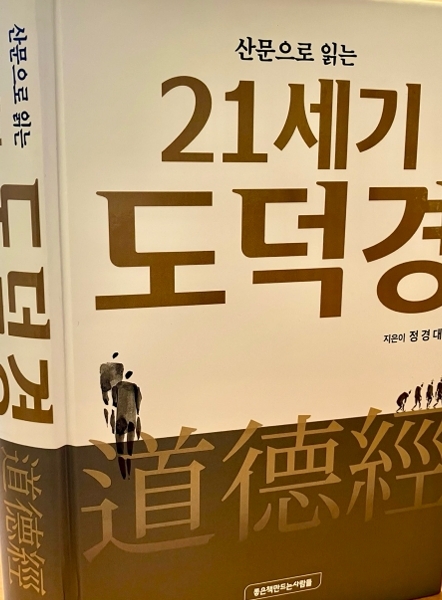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경대 한국의명학회 회장(종교·역사·철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