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입추와 말복이 지나면서 여름내 꽃을 내달고 태양과 맞서던 능소화의 색도 조금씩 바래어가고 배롱나무 붉은 꽃도 시나브로 떨어져 내린다. 조금씩 하늘이 멀어지고 멀어진 만큼 하늘빛도 점점 쪽빛을 닮아간다. 어느 해보다 뜨겁던 여름을 견디며 한낮의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시간을 내어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다. 둘레길을 걸을 때마다 숲이 가까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란 생각을 했다. 집을 나서서 천천히 걸어도 숲에 이르는 데에는 십 분이면 충분하다.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숲의 너른 품에 안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숲은 멀리서 바라보면 거대한 초록의 바다일 뿐이지만 숲은 수많은 길을 품고 있다. 날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숲은 늘 새로운 풍경을 펼쳐 보여준다. 어제 보았던 꽃은 어느새 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 있기도 하고, 새와 매미의 울음소리도 매번 새롭게 들린다. 나뭇잎 사이로 비껴드는 햇빛이나 바람도 결이 다르고, 그 길을 걷는 나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기에 늘 새로운 길을 걷는 것 같다. 그 작고 미묘한 변화를 읽으며 숲길을 걷다 보면 나의 숲길 산책은 단순한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숲은 말이 없으나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숲의 침묵만큼 따뜻한 위로도 없다. 길섶에 피어 있는 노란 달맞이꽃이라든가, 보랏빛 칡꽃의 향기를 맡아본 사람이라면 그 옅은 꽃향기가 건네는 위로가 얼마나 오래도록 가슴을 향기롭게 하는지 알 것이다. 어제는 숲길을 걷다가 누리장나무 흰 꽃을 보았다. 요즘 둘레길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꽃이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누리장나무는 잎에서 나는 냄새로 천적을 물리친다. 그 냄새로 인해 누리장나무란 별로 향기롭지 않은 이름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꽃만 보면 여느 꽃에 견주어도 지지 않을 아름다운 자태를 지녔다.
꽃은 7월 중순부터 8월에 걸쳐 핀다. 흰색 꽃이 잎겨드랑이에서 총상꽃차례 형태로 모여 피는데 아름답기 그지없다. 나비의 더듬이처럼 길게 늘어지는 꽃술이 매달린 분홍빛과 하얀색으로 이뤄진 꽃은 가는 발걸음을 멈출 만큼 여름꽃 중 가장 화려하다. 그런가 하면 벌과 나비를 불러들일 만큼 향기도 짙고 꿀도 많다. 9월이 되면 짙은 감색의 열매를 맺는데 별 모양의 꽃받침과 어우러져 마치 여성 액세서리인 브로치를 닮았다. 날마다 새로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 꽃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을 지켜보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순수를 꿈꾸며’란 시에서 “모래 한 알에서 세계를 보고/ 들꽃 한 점에서 천국을 보니/ 네 손 안의 무한을 움켜쥐고/ 순간 속의 영원을 놓치지 마라”고 했다. 아직 여름이 끝난 것은 아니나 가을을 예감할 수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추 한 알’이 붉어지고 둥글어지는 시간을 헤아릴 수 있는 혜안을 지닌 당신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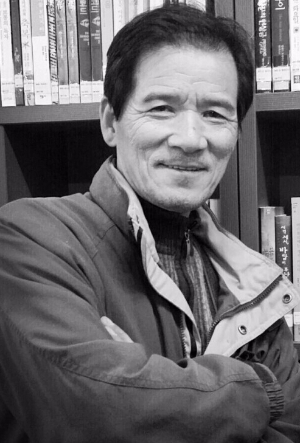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