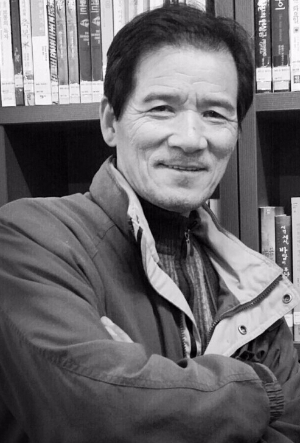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하루에 200m씩 고도를 낮춘다고 한다. 산 정상부터 전체가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단풍의 시작으로 보고, 80% 정도 물들었을 때를 절정으로 본다. 단풍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잎 속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색소가 드러나는 현상으로 식물은 일 최저기온이 5℃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어느 스님이 말하기를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고 했다. 봄꽃은 봄꽃대로, 가을 단풍은 가을 단풍대로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니 스님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해도 가을 단풍이 봄꽃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지닌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곱게 물든 단풍 사진이나 찍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늦은 오후에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굳이 백운대 정상까지 오를 생각은 없었다. 가까운 계곡에 가서 붉게 물든 단풍잎 몇 장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을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다. 우이동에서 진달래 능선을 타고 산을 오르는데 좀처럼 단풍을 만날 수가 없다. 멀리 바라보이는 백운대 산자락엔 울긋불긋 단풍이 든 듯한데 정작 내가 걷는 산길엔 마른 낙엽만 뒹군다. 은근히 오기가 생겨 단풍을 만날 때까지 산을 오르기로 했다. 그리고 대동문 근처에서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만났다. 마침 산을 내려오던 외국인이 단풍을 보고 '원더풀'을 연발했다.
그러고 보니 북한산엔 외국인 등산객들이 유난히 많다. 이제 북한산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산이 된 것만 같다. 국적도, 피부색도 다양해 마치 잘 물든 가을 산 같다고나 할까. 대동문 가로는 노란 산국이 무더기로 피어 맑고 그윽한 향기를 풀어놓고 있다. 대동문을 지나자 비로소 붉은 단풍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서편으로 기운 햇살을 받은 단풍들이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풍경은 산을 오르느라 지친 심신의 피로를 단숨에 날려버린다. 용암문을 지나 노적봉에서 만경대의 단풍을 한껏 눈에 담고 내친김에 백운대까지 오른다. 서편 능선으로는 울긋불긋 단풍이 제대로 물들었다.
정상에 오르니 바람이 차다. 백운대 정상에 서니 서울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미세먼지가 없어 저 멀리 강 건너 롯데타워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햇살이 비치는 곳엔 단풍이 곱게 빛나고 있지만 산 그늘진 반대편으로는 벌써 땅거미가 지고 있다. 산중의 어둠은 빨리 찾아온다. 서둘러 산을 내려오며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등산 격언을 떠올렸다. 인생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인생의 오후란 가을 단풍처럼 곱게 물들어 가는 시기이며 등산으로 치면 하산길이기 때문이다. 낙엽 하나 어깨를 치며 묻는다. 당신의 가을은 무사하신가.
백승훈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