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건 따라 희비 엇갈린 주가…AMD '고위험 베팅'에 40% 폭등
AI 시장 제패 열쇠는 '소프트웨어'…AMD, 엔비디아 아성 넘을까
AI 시장 제패 열쇠는 '소프트웨어'…AMD, 엔비디아 아성 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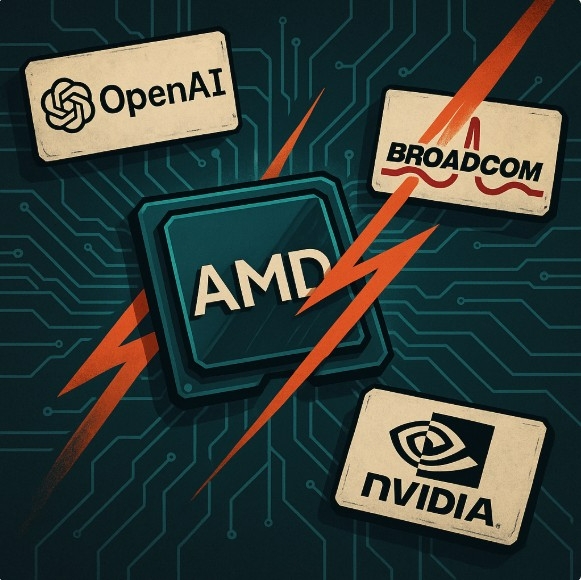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심장인 반도체를 둘러싼 거인들의 합종연횡이 숨 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AI 시대의 '총아'로 떠오른 오픈AI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잇달아 손을 잡으면서 시장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오픈AI의 막대한 자금 소진 계획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2029년까지 무려 1150억 달러(약 16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픈AI의 재정적 불확실성이, 이들 반도체 기업에 각기 다른 형태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고 IT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지난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특히 계약 발표 후 주가가 40% 이상 폭등한 AMD가 가장 큰 하방 위험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엇갈린 계약 조건, 명암 가른 주가
지난 한 달간 세 반도체 거인이 오픈AI와 맺은 공급 계약은 그 형태와 조건이 판이하다. 가장 명확한 것은 브로드컴의 사례다. 브로드컴은 오픈AI와 맞춤형 칩을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반면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는 오픈AI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진행 상황에 맞춰 최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에 달하는 직접 투자를 약속했다. 이 계약은 오픈AI의 성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엔비디아 스스로가 이 신생 기업의 위험에 더 깊숙이 노출되는 구조다. 흥미롭게도 계약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가장 극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AMD의 계약이다. AMD는 오픈AI의 AI 칩 구매 약속을 대가로, 신주인수권(warrant) 형태로 자사주를 최대 10%까지 내주기로 했다. 이 방식은 당장의 현금 지출 없이 미래의 성공을 공유하지만, 오픈AI의 칩 사용 여부와 자사 주가에 모든 것이 연동되는 고위험·고수익 구조다. AMD는 자사 주가가 현재보다 약 3배로 뛰어올라야만 마지막 신주인수권을 오픈AI에 넘겨준다는 조건을 걸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의 차이는 즉각 주가에 반영됐다. 계약 소식 전 세 기업은 모두 내년도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기준 약 32배 수준에서 거래됐으나, 이후 AMD는 43배까지 치솟았다. 반면 브로드컴은 33배, 엔비디아는 27배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수요 과대평가했다면 누구 손 잡을까"
투자자들의 우려는 오픈AI가 예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에 집중된다. 16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규모 자산운용사 래퍼 텡글러 인베스트먼츠의 제이미 마이어스 매니저는 "문제는 오픈AI가 컴퓨팅 수요를 과대평가했다면, 그들은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순일 것으로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AMD 측은 이러한 구조가 양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고 강조한다. 리사 수 AMD CEO는 계약 발표 당일 투자자들에게 "오픈AI는 우리 칩 배포가 성공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픈AI가 더 많이 배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 그들도 그 성장의 일부를 나눠 갖는다"고 설명했다.
사업구조가 가른 위험 분산 능력
반면 AMD와 브로드컴은 상대적으로 사업 다각화가 잘 되어있다. AMD의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 비중은 가장 최근 분기 기준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2021년의 약 20%에서 두 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개인용 컴퓨터(PC) 및 산업용 칩 판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브로드컴은 더욱 안정적이다. AI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부문이 다른 칩 제조사들보다 높은 마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계약 발표 후 주가가 10% 가까이 상승한 브로드컴은 또 다른 강점을 지닌다. 고객을 위해 칩을 처음부터 맞춤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사업 모델은 고객이 구매 약속을 번복할 가능성을 낮춘다. 완제품 형태로 칩을 판매하는 엔비디아, AMD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으로, 오픈AI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브로드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키뱅크 캐피털 마켓의 존 빈 분석가는 "지난 몇 년간 AMD가 시장의 새로운 진입자로서 AI GPU 시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며 엔비디아보다 높은 밸류에이션 배수로 거래되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높은 가치는 이미 시장에서의 성공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결과라며, 몇 분기 전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overweight)'에서 '중립(neutral)'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빈 분석가는 또한 "AMD의 AI 칩 판매 모멘텀이 둔화하는 조짐도 보인다"고 덧붙였지만, 내년에 출시될 신제품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넘기 힘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성벽'
궁극적으로 AMD의 성패는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아성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시장에서는 AMD가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뺏어와 2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본다. 현재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80~90%로 추정된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진정한 해자(垓子)는 하드웨어가 아닌 '쿠다(CUDA)'로 대표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다. 파운데이션 캐피털의 투자자 아슈 가그는 "내가 투자한 회사의 엔지니어 대부분은 엔비디아 소프트웨어에 익숙하며, AMD의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AMD 시스템이 5%나 10% 더 저렴하다고? 그래서 뭐?'라는 식"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곧 수익성으로 직결된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매출 총이익률이 약 70%에 달하는 반면, AMD는 50%를 밑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장이 엔비디아를 가장 낮은 가치평가 배수로, AMD를 가장 높은 배수로 평가하는 상황이 모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 반도체 회사가 오픈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지만, 그 파도가 언제든 자신들을 덮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안게 된 셈이다. 래퍼 텡글러의 마이어스 매니저는 "향후 1~2년간은 수요가 구체화되며 오픈AI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지만, 4~5년 뒤에는 전혀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을 수 있다. 물론이다"라며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