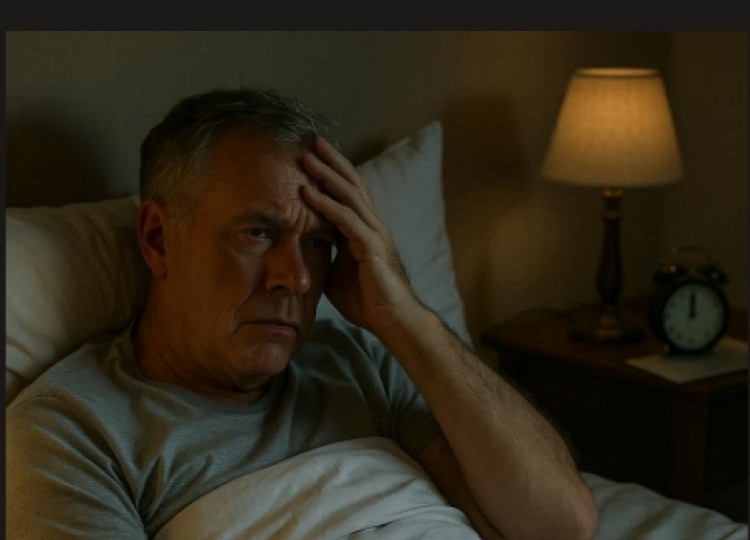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전반에서 적자를 낸 조합 수도 2021년 25곳에서 2025년 222곳으로 8.8배 급증했다.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은 1.34%에서 6.88%로 5배 이상,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규모도 4조8862억 원에서 24조6827억 원으로 불어났다. 업권별로는 수협 8.11%, 산림조합 7.46%, 농협 5.07% 등 전 업권에서 위험 수위가 동시에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들 부실의 진원은 대부분 부동산 PF에서 비롯됐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은 본래 조합원과 지역 주민의 생활자금,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서민 밀착형 금융’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급변했다. 지역 경기침체와 저금리 속에서 수익 압박이 커지자 일부 금고·조합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수익형 부동산·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등 고위험 자산에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특히 2021년 이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시행사 중심 PF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지방 중소 금고들까지 시행사 지분 투자, 브리지론 제공, 자기자본 투입 등 고수익·고위험 구조에 참여했다. 일부 금고는 총대출 중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30~40%를 웃도는 수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외곽의 생활숙박시설(이른바 ‘레지던스형 호텔’)·오피스텔 분양형 PF에 집중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문제는 이런 대출이 은행권보다 훨씬 부족한 심사 인력과 사후관리 인프라 아래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프로젝트별 위험도를 면밀히 평가하지 않은 채 시행사 신용이나 담보가치만 보고 자금을 공급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 결과 미분양이 늘고 금리 상승으로 차주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상호금융권 전체를 부실로 몰아넣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예금은 일반 은행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각 중앙회가 자체 조성한 ‘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전하지만, 2025년 기준 이 기금 규모는 새마을금고 약 4조 원, 신협 약 3조 원에 불과하다. 반면 예금잔액은 각각 270조 원, 160조 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 보호기금 적립률은 1~2%대에 그친다.
실제로 2010년대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당시에도 중앙회 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정부가 5000억 원대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 전례가 있다. 대형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구조인데도 현행 제도 아래선 ‘조합 간 상호부조’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금융위·농식품부로 나뉜 감독체계 역시 문제다. 부처별로 관리되는 현행 체계로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건전성 관리 체계 속에서 다뤄야 한다.
상호금융권이 흔들리면 단순히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PF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예금인출 사태로 번져 금융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상호금융 문제를 단순한 ‘지역 리스크’가 아니라 ‘전국적 금융 리스크’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