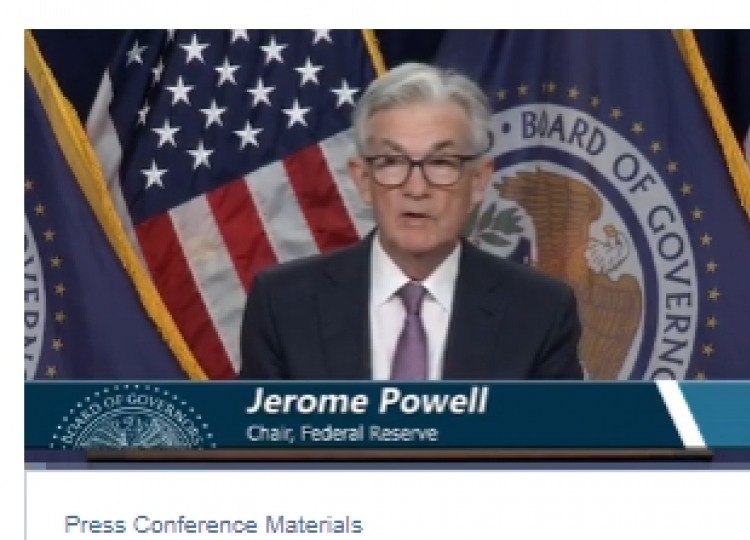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 중 시장에서 퇴출당한 기업 비중은 지난 3년 평균 0.4% 정도다. 2014년 이후 5년간 4%의 부실기업 중 2%가 퇴출당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면 국내 투자를 2.8% 늘리고, 국내총생산(GDP)도 0.4%P 늘릴 수 있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계기업 퇴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성장 동력도 약해졌다는 의미다.
한계기업의 생존 기반은 정부와 금융권의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세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며 부실 위험 기업을 도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에 만기 연장 대출 규모만 44조 원에 이를 정도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돌아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아 연명치료를 해주는 격이다.
한은이 외부 감사 대상 약 2200개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를 유지한 곳은 상위 0.1%에 해당하는 대기업뿐이다.
나머지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금융지원 덕분에 공장만 돌리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
풍부한 유동성에도 신산업에 투자하지 못한 것은 수익성이 워낙 낮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부실기업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도 다르다.
부실기업 정리는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도 높일 수 있다. 정부나 금융권의 자금이 신생기업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 메커니즘이 살아있으면 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미국 기업의 폐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치유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