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에 있는 ‘사릉(思陵)’은 조선 왕조 비극의 주인공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의 능이다. 정순왕후는 15세에 한 살 어린 단종과 결혼해 왕비가 되었으나 이듬해 단종이 수양에게 왕위를 넘기고 상왕이 되자 왕대비가 되었지만 그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육신의 단종 복위가 무산되며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되면서 정순왕후도 부인으로 강봉되고 이후 관비로 신분이 추락했다. 관비가 된 정순왕후는 세조의 명에 따라 자손이 없는 후궁들이 머무르는 정업원에 살며 염색으로 생계를 이었다. 서울 창신동에는 '자지동천(紫芝洞泉)'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 밑에 샘물의 흔적이 있다. 정순왕후가 흰 옷감을 자줏빛으로 염색해 생계를 유지했다는 일화가 전하는 곳이다.
정업원 인근 산봉우리는 단종이 영월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순왕후가 동쪽인 영월을 바라보며 남편의 명복을 빌었다 해서 '동망봉(東望峰)'으로 불린다. 단종의 유배지 영월 청령포에도 단종이 자주 올라 왕비를 그리워했다는 노산대와 왕비를 위해 쌓아 올린 돌탑이 남아있어 부부의 애틋한 사연을 더해주고 있다. 정순왕후는 거처와 양식을 준다는 세조의 제안을 거절하고 82세에 숨을 거두기까지 64년간 단종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중종은 정순왕후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 국장으로는 할 수 없어 단종의 누이인 경혜 공주가 출가한 집안에서 장례를 주도하고 해주 정씨 가족 묘역에 안장됐다. 이후 1698년 숙종에 의해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위되고 송씨도 정순왕후로 복위되었다. ‘한결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기도해 그 덕이 깊다’는 뜻을 담아 능호를 ‘사릉(思陵)’이라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사릉은 단릉으로 웅장하지도 호화롭지도 않다. 능침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했고 석양과 석호를 줄였다. 하지만 왕릉으로서 기품만은 잃지 않았다. 문석인·석마·장명등·혼유석·망주석은 작게 조성하고, 홍살문·정자각·비각도 서 있다. 사릉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소나무다. 이곳에는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각 궁과 능에 필요한 나무를 기르는 양묘 사업소가 있다. 특히 이곳 소나무 묘목은 태백산맥 능선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5대조 묘인 준경묘와 영경묘의 낙락장송 후손으로, 숭례문 복원에 사용될 정도로 한국의 대표적인 소나무다. 1999년, 사릉에서 재배된 묘목을 단종의 무덤인 영월 장릉에 옮겨 심어 단종과 정순왕후가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고 못다 한 정을 나누게 했는데 그 소나무가 ‘정령송(精靈松)’이다.
사릉에 갔을 때 능 주변의 소나무 숲은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잘라낸 나뭇가지를 쌓아 놓은 청솔가지 더미에서 솔향이 짙게 풍겼다. 짐작하기로는 겨울철 설해를 대비하기 위한 작업인 듯한데 가지를 너무 쳐서 나무와 나무 사이가 휑하다. 소슬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낙엽이 진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때 비로소 그리움은 피어난다. 그래서 그리움은 손끝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리라.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 사릉의 솔숲을 흔드는 바람결에도 묻어나는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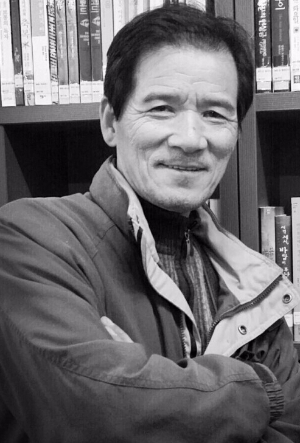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