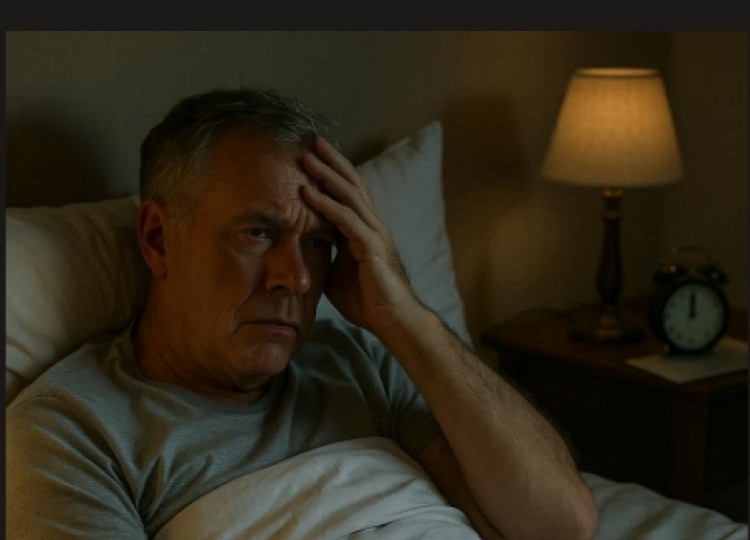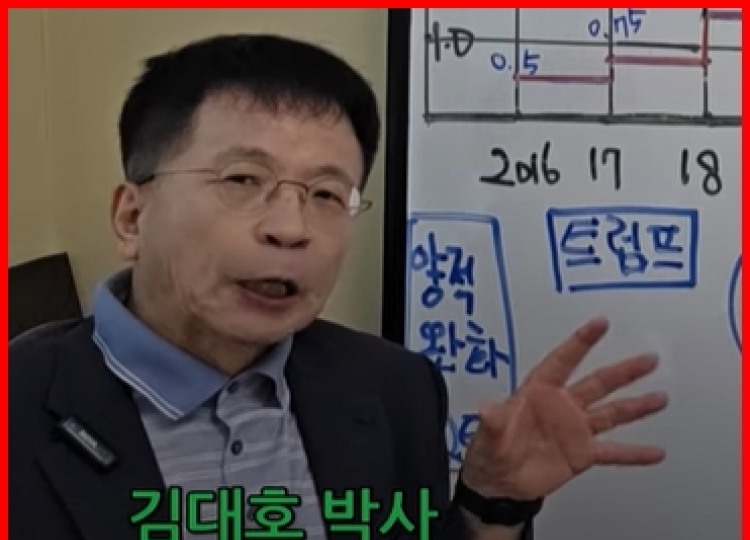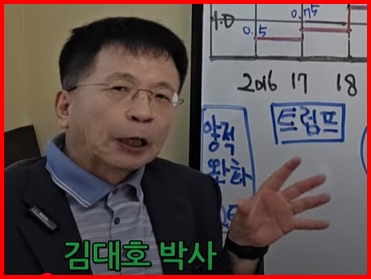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바퀴벌레로 변신한 그날도 그레고르는 오로지 가족을 생각하며 출근을 하려고 했다. 흉칙한 모습을 본 아버지는 바퀴벌레로 변한 그레고르에게 몽둥이질을 하고 급기야 방으로 몰아넣어 감금해 버린다. 그레고르는 가족의 학대 속에 죽어간다.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누구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인류 역사상 바퀴벌레는 오랫동안 저주와 불안의 대상이었다. 음식을 축내고 나아가 치명적인 전염병을 옮기는 바퀴벌레의 속성 때문일 것이다. 카프카의 '변신'은 바퀴벌레에 대한 인간의 혐오를 잘 나타낸다.
그 바퀴벌레가 뉴욕증시에 소환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체이스 은행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바퀴벌레를 토론의 장으로 불러냈다. 다이먼 CEO는 바퀴벌레를 모두 찾아내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다이먼이 말하는 바퀴벌레란 한때 잘나가다 지금은 무너져 내린 이른바 부실 기업이다. 금융의 속성상 부실은 전파된다. 그 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뉴욕증시 전체가 부실에 전염되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 한때는 가정을 먹여 살리는 사실상의 가장이었으나 바퀴벌레로 변하는 순간 가족에 의해 도륙당할 수밖에 없는 '변신'의 그레고르와 같은 존재다.
다이먼은 이날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최근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 트라이컬러가 파산한 것과 관련해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면 아마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면서 "모두 이에 대해 미리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먼은 CNBC 인터뷰에서도 "2010년이나 2012년 정도부터 약 14년간 신용 강세장을 누려왔다"며 트라이컬러 파산 사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과열된 상태에 있다는 초기 신호"라고 말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중 트라이컬러 파산 사태와 관련해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상각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트라이컬러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을 벌여왔다. 최근 파산을 신청한 트라이컬러는 현재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공급사 퍼스트브랜즈가 파산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이먼의 바퀴벌레 발언은 경제 공황에 대한 경고다. 뉴욕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뜨거운 불장이지만, 그 속에 돌연한 침체를 몰고 올 바퀴벌레와 같은 부실 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여파로 영향을 받는 은행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 교수도 폭발 장세 속 급락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주식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려면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yclically adjusted price-to-earnings ratio)’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은 줄여서 ‘CAPE 비율’이나 ‘실러 P/E’ 비율이라고 부른다. 이 CAPE 비율은 주가를 기업의 10년 평균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인 ‘주가수익비율(PER)’은 주가를 기업의 연간 수익으로 나누지만, CAPE 비율은 10년간의 수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PER보다 큰 그림에서 주식시장의 거품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뉴욕증시의 CAPE 비율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CAPE 비율이 30을 넘어섰다. 역사적으로 CAPE 비율이 30을 넘어선 것은 딱 두 번뿐이다. 1929년 대공황 직전과 2000년 닷컴버블 때 그랬다. 1980년 이후 CAPE 비율 평균은 19다. 지금 CAPE 비율이 30을 넘었다는 것은 뉴욕 주식시장의 거품 경고다. 실러 교수는 CNBC와 한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뉴욕증시는 변동성이 극히 높은 데다 주가수익비율이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상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가총액이 대규모로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러 교수는 “폭풍 전야의 고요에 젖어있는 뉴욕증시를 보고 있자면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 낙관론이 팽배하지만 소수 미국 기업에 대한 높은 투자 집중도, ‘그림자 금융’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겉보기의 평온함이 구조적 문제의 실상을 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 전쟁 긴장, 지정학적 불확실성, 정부 부채 증가 등 하방 위험에도 시장 참가자들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리스크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펀더멘털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뉴욕증시 S&P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은 22.8배 수준이다. 5년 평균(19.9배)과 10년 평균(18.6배)을 크게 웃돈다. 올해 S&P500 연간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의 컨센서스 10.9%를 감안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과열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투자 집중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S&P500 지수의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닷컴버블 당시를 넘어서는 극심한 쏠림이다. 2025년 실적 시즌 M7 그룹의 전년 대비 성장률 컨센서스는 26.6%다. 나머지 493개 기업의 성장률은 4%에 불과하다. 이런 집중은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 국장은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평가돼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AI)과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투자자 기대의 변화는 자산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7 주가가 급락할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막대한 규모의 패시브 펀드들이 기계적인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 전체의 급락을 유발하는 ‘꼬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현금성 자금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다. 풍부한 유동성은 자산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 시장 심리가 급변할 경우 대규모 자금 이탈을 촉발해 변동성을 증폭하는 ‘유동성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론도 물론 만만치 않다. AI가 계속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이 웬만큼 높아져도 끄떡없다는 것이다. 늘어난 유동성이 인플레보다는 공급을 더 늘리는 확대 균형 쪽으로 가고 있다는 뉴노멀 이론도 있다. 그렇다고 유비무환과 거안사위(居安思危)의 교훈을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잘나갈 때 조심하라는 뜻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