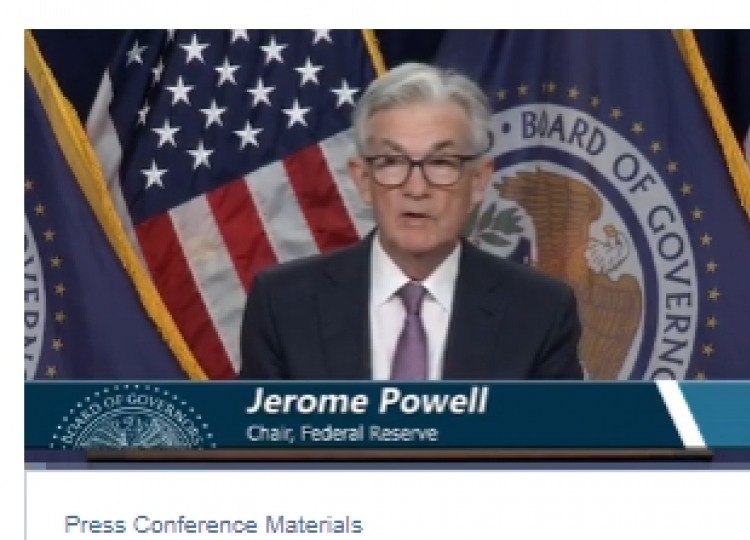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서울,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없다
9·7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선호도가 높은 서울 등 핵심 지역 공급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강조됐지만 ‘알맹이’가 빠졌다. 서울 신규 공급 물량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휴용지 등 4000가구에 불과하다.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공사를 착공한다는 로드맵도 내놨지만 실제로 얼마나 공급될지도 미지수다.
과거 정부의 공급 대책도 인허가와 착공 등에선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진 물량은 훨씬 적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간 54만 가구 인허가에 입주는 39만 가구였다. 윤석열 정부도 입주는 30만 가구대에 그쳤다는 통계가 방증한다. 공급난 해소 취지에 비해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6·27부동산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다.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다. 대표적으로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이 있다. 하지만 9·7부동산대책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제외돼 서울 주택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는 전략도 우려가 높다. LH는 지난해 전국 공공분양 1420가구, 통합임대 982가구, 행복주택 544가구 등 총 2946가구 착공에 그쳤다. 연간 목표치 약 5만 가구의 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LH는 부채 규모가 올해 170조1817억 원으로 구조적인 주택공급 동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LH 공공택지 판매 지연과 임대주택 운영 손실 등 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 서민 주거불안 심화
정부는 시장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서울 등 핵심 지역 실질 공급 확대, 실행력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민간 협력체계 강화, 수요에 맞춘 주택정책 전환도 필수적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지나친 대출 규제는 오히려 무주택·저소득 실수요자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새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공급 면에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와 민간 협력 없는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은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핵심 지역에 실질적인 입주 가능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집값 불안, 입주 대란, 투자 쏠림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문재인 시즌2’를 우려하는 이유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