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서울에선 매화를 볼 수 없으나 추위가 채 가시기 전에 꽃을 피우는 매화는 예부터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고고한 선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일례로 조선 최고의 화가 단원 김홍도는 그림값으로 받은 3000냥을 매화나무 사는 데 2000냥을 주고, 벗들과 술잔치를 위해 700냥, 나머지 300냥으로 땔감과 곡식을 바꿨을 만큼 매화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다. 굳이 매화가 아니라도 봄에 피어나는 꽃치고 어여쁘지 않은 꽃은 없다. 길섶에 피어나는 봄까치꽃이나 쇠별꽃도 아름답고 눈 속에 피어나는 노루귀꽃이나 복수초, 바람꽃도 어여쁘기 그지없다. 류시화 시인이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다’라고 했지만 흔들리며 피는 꽃치고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다.
집 안에 화분 몇 개 들여놓고 조용히 봄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찾아 나서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봄이 아닐까 싶다. 꽃샘바람이 맵차도 문밖으로 나서면 여기저기 봄의 기미가 눈에 들어온다. 겨우내 땅바닥에 바짝 붙은 채로 겨울을 난 민들레나 고들빼기 같은 로제트 식물들이 조금씩 잎을 키우는 모습을 보거나 수양버들 가지에 감도는 연둣빛 안개라든가, 조팝나무에 막 돋아난 새 움을 보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된다. 산길로 들어서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의 얼음이 풀려 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도 한결 명랑하게 들리고, 죽은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의 움직임도 경쾌하기만 하다.
나이 들수록 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짐을 느낀다. 아직 나에게 몇 번의 봄이 더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껏 지나온 봄보다 훨씬 적게 남았다는 것은 분명해서일까. 오는 봄이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특히 봄이란 계절은 오는가 싶으면 이내 가버리는 계절이라서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나는 봄을 맞으며 새로운 루틴을 하나 만들기로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침 산책이다. 산자락의 2㎞ 정도 되는 둘레길을 아침마다 걷는 것이다. 날마다 그 길을 걸으며 봄이 오는 숲의 풍경을 관찰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숲의 풀과 나무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나 다람쥐나 청설모 같은 작은 산짐승들의 모습도 관찰하고 기록해볼 생각이다.
꽃샘바람이 제아무리 매워도 곧 지나갈 것이다. 눈비를 맞으면서도 꽃들은 피어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어느 계절이나 그러하지만 봄은 늘 갈지자걸음으로 온다. 이즈음에 부는 바람을 두고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라고 부르지만, 바람은 절대로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 바람은 기운을 북돋우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때론 지나쳐서 꽃들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꽃의 숙명일 뿐 바람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꽃샘바람 때문에 봄이 더디 온다고 해도 바람을 탓하지는 말 일이다. 꽃샘바람 불어도 꽃은 피고 봄은 온다. 꽃샘추위에 시달리는 것은 곧 꽃이 필 거라는, 그래서 봄이 올 거라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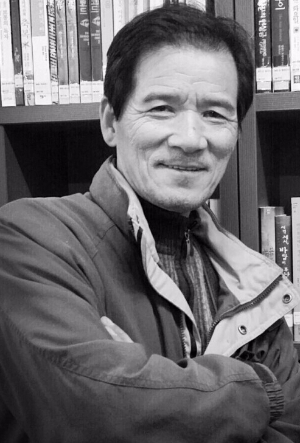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