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문으로 읽는 21세기 도덕경' 제7장

석가모니 붓다가 불교 경전 금강경에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想), 수자상(壽者相) 때문이라 했다. 아상은 '나'에 대한 이기적 집착이고, 인상은 인간만의 욕망에 대한 집착이고, 중생상은 일체 생명체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집착이고, 수자상은 오래 살고자 괴로워하는 집착을 뜻한다. 이 모든 상은 한마디로 번뇌이고 번뇌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불경 반야심경에서는 무아에 들면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어 없어질 것도 없다고 했다. 이 모든 뜻이 사람이 하늘과 땅처럼 죽지 않고 장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도를 얻어 위함이 없이 위하는 무위를 깨닫고 도와 같이 덕을 베풀고 살면 삶도 죽음도 초월한다는 신령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비유로 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하늘은 장(長)하고 땅은 구(久)한다'라는 문구에서, 그냥 '천지는 장구한다(天地長久)'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하늘은 장하고 땅은 구한다고 분리해 놓았을까? '장'과 '구'는 '오래다' 혹은 '길다'로 뜻이 같다. 그런데 '久(구)'라는 상형은 '長(장)'과 뜻이 사뭇 다르다. '장'은 뜻 그대로 '오래다' '길다'다. 하지만 '구'는 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은 모양을 상형한 문자다. 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았다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가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천장지구는 하늘은 본래대로 영원하지만, 땅은 언젠가는 감싸인 하늘에서 떨어져 나가 어디론가 사라질 것이란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 종말론이 심심찮게 떠도는 것일까? 하늘의 보석처럼 빛을 내는 셀 수 없는 별 중에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벗어나 사라지는 수많은 유성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별도 유성이 되어 불시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지구와 함께 영영 사라질 테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구가 없어지면 당연히 인간도 살아남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전해지는 불가사의한 예언 같은 가르침이 생각난다. 한민족의 상고대 역사서 환단고기에 기원전 3898년 음력 10월 3일, 우리 민족을 밝은 땅의 민족이 사는 나라라는 뜻에서 배달국이라 하고, 홍익인간을 국시로 신시(神市·신성한 나라)를 개천(開天)한 1세 환웅 천황 거발환이 가르친 바 기록이 있다. "너희가 사는 이 땅이 큰 듯하나, 칠백 세계 중 일백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종교에서 백일기도가 있는 것일까? 하여튼 우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태양계가 여섯 개 더 있다는 뜻이다.
그리 생각하면서 몽상에 취해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펴본다. 육신은 죽어서 지구와 함께 사라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천상의 낙원이라 할 만한 또 다른 세계의 지구별로 옮겨가 생을 이어갈 것이란 별스러운 공상에 젖어본다. 그런데 이 장의 끝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그 몸을 밖에 둠으로써 스스로 오래 존재하는데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움을 성취한다'라고 했다.
몸을 밖에 둔다는 것은 감싸안음이다. 하늘이 땅을 감싸안고 땅은 자연을 감싸안고 있으므로 오래오래 자연이 존재한다. 보자기가 그러하다. 보자기는 사사롭게 쓰일 물건을 밖에서 감싸안는다. 하지만 보자기는 제 이익을 위해 사사롭게 감싸안음이 아니다. 감싸안아야 할 사사로움을 무위로 성취하고 있으므로 사사로운 물건보다 장구하게 존재한다. 성인의 처신이 그러하다. 사사롭게 살아가는 백성을 보자기처럼 감싸안아서 품는다. 그리하여 백성 개개인이 사사로움을 바르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위로 감싸안는다. 성인의 사사로움은 성인 자신을 위한 사사로움이 아니므로 보자기처럼 그 존재가 오래오래 잊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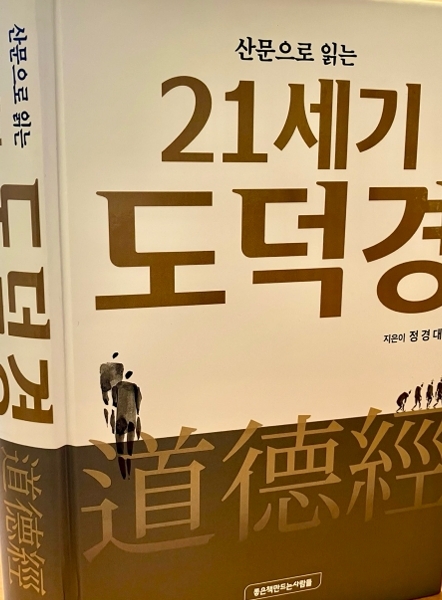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경대 한국의명학회 회장(종교·역사·철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