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문으로 읽는 21세기 도덕경' 제5장

추구(芻狗)는 고대 중국에서 짚이나 풀로 엮어 제사상에 놓는 개[犬]를 뜻한다. 제사 지낼 때는 귀하게 모셔지지만 제사가 끝나면 하찮은 쓰레기로 버려진다. 하필 개를 제사상에 올리는 이유는 개가 잡귀 침범을 막아주는 짐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를 무덤을 지키는 수문장이란 뜻에서 엄무(閹茂)라고도 한다.
쓸 때는 귀하게 여기지만 쓰고 나면 버리는 행위는 참 비정하고 인자하지 않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과 땅이 인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 더더구나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격상된 석가모니 붓다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인을 인자하지 않다니 고개가 갸웃해진다. 그러나 자연 현상을 살펴보면 뜬금없는 말이 아니다.
도가 만물을 낳고 길러주는 것은 더없이 귀한 덕을 베푸는 것이다. 하지만 만물이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병들어 죽어가도 구원해주지 않으니 어질기는커녕 매정하기 이를 데가 없다. 성인 역시 백성이 착해지도록 교육해 그 영혼이 참되도록 깨우쳐줄 뿐 가난도 버려두고 늙고 병들어 죽어도 구원해주지 않는다. 하늘이나 땅이나 성인이나 무위하여 무상한 자연에 맡길 뿐이다. 하지만 도는 자연을 변화시켜 죽어간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고, 성인은 진리를 설파해 비록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을 올곧은 쪽으로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노자는 뒷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 도와 성인을 동일시해 말하기를, 그 덕은 착한 이를 돕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런데 셋째 구절에서 하늘과 땅 사이 뜬금없이 '풀무질'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늘도 인자하지 않고 성인도 인자하지 않다"에 뒤이어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질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짝이 다른 두 토막을 이어놓은 듯 도무지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숙고해보면 서로 맞지 않는 구절을 연속해 이은 것은 아마도 문자 이면의 심오한 무언가를 바른 지혜로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노자 선생의 속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풀무는 옛날 대장간에서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때 쓰이는 도구다. 튜브 같은 빈 관 속에 굵고 긴 막대를 밀고 당기면서 바람을 일으켜 숯불을 타오르게 해서 쇠를 녹여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 이것을 풀무질이라 하는데 급하게 많이 하면 불꽃이 너무 세서 쇳물이 녹아 넘쳐 도구를 만들 수 없고, 너무 느려도 불꽃이 약해서 쇠를 녹일 수 없으므로 도구를 만들 수 없다. 이는 마치 하늘에서 뇌성 번개가 천하를 뒤흔들고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면 땅에서는 뭍 생명이 죽거나 병드는 등 대혼란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처럼 풀무질을 거칠게 하면 광란을 일으키듯 타오르는 불꽃에 물처럼 녹은 뜨거운 쇳물이 넘쳐흘러 도구는 물론 대장간도 파괴된다. 이런 현상을 사람의 마음에 비유해보자. 분노·원한·고통 등등 번뇌에 사무치면 숨이 거칠어지고, 숨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따라 거칠어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하늘에 미풍이 불 듯 숨도 고요해진다. 마치 부드러운 풀무질로 좋은 도구를 만드는 것의 비유가 된다.
풀무질을 한자어로 탁약(橐籥)이라 한다. 탁은 풀무이고 약은 피리란 뜻이다. 피리를 거칠고 심하게 풀무질하듯 불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에 노자는 심한 풀무질이나 피리 소리에 비유해 말이 많으면 곤란한 일을 당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장의 전체 뜻을 요약하면, 콧구멍을 풀무에, 쉬는 숨은 풀무질과 피리 부는 것에 비유한 명상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면 거친 풀무질이나 폭풍처럼 발광하는 번뇌를 멸하고 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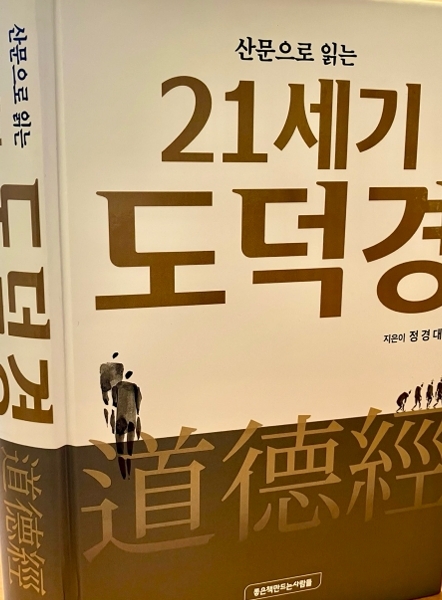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경대 한국의명학회 회장(종교·역사·철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