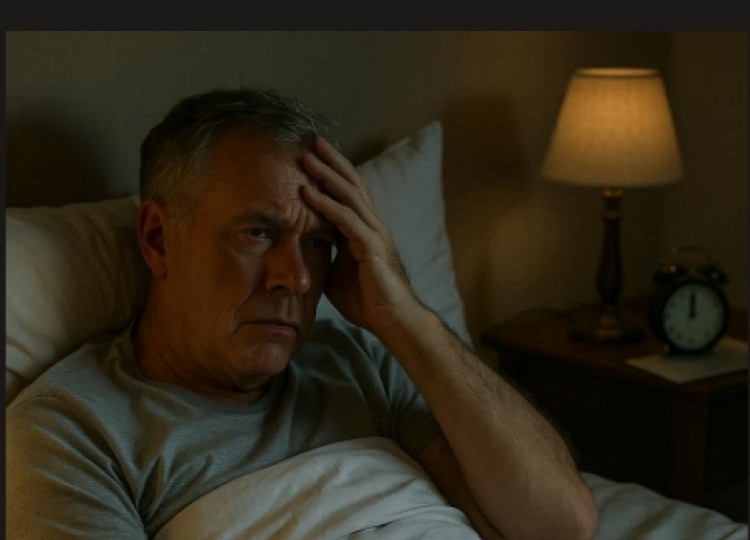하이브·CJ, 한국식 훈련·기획 시스템 수출 주도
팬덤 주력 해외로…'K' 지워도 '한국의 혼' 남아
팬덤 주력 해외로…'K' 지워도 '한국의 혼' 남아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K-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국제 수요는 이미 여러 지표로 확인된다. 2025년 10월 발표된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와 CJ ENM 간의 공동 제작 협력은 그 최신 사례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 역시 구독자의 80% 이상이 K-콘텐츠를 시청한다. 음악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패션, 미용, 식품을 아우르는 K-컬처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310억 달러(약 44조 원)를 돌파했다. 이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전체 해외 판매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K팝이 통합된 한류 산업군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한류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진화해왔다. 1990년대 내수용 콘텐츠가 일본, 대만 등지에 한정돼 수출되던 시기를 지나, 2000년대에는 가수 비와 드라마 '대장금'이 아시아 전역에서 팬층을 형성했다. 2010년대는 본격 도약기였다.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등 대형 세계 작품이 쏟아졌고, BTS와 블랙핑크가 데뷔했으며,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메이드 비욘드 코리아', 국적 경계 허문 융합
2020년대는 국경을 초월한 '메이드 비욘드 코리아(Made Beyond Korea)'의 시대다. 서울에 기반을 둔 음악 서비스 기업 'DFSB 콜렉티브'의 버니 조 대표는 "콘텐츠의 뿌리는 한국 문화이지만, 제작에 참여하는 '손'은 더 이상 한국인일 필요가 없다"고 현시대를 정의했다.
'융합' 정체성은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구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태국 출신으로 아시아 전역의 문화 상징이 된 리사, 서울에서 태어나 뉴질랜드에서 유학한 제니, 뉴질랜드 출신으로 호주에서 성장한 로제, 그리고 유일한 한국 토박이 지수로 구성된 이 조합 자체가 '포용하는 K팝'의 표본이다. 세계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식 훈련과 기획 체계가 중심축 노릇을 한다. K팝이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문화를 흡수하며 확장하는 존재라는 분석이다.
K-컬처 산업의 해외 중심축 이동은 인구 감소와 내수 시장 정체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다. 5000만 내수 팬이 아닌 80억 인구 시장을 상대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중국 기업들이 내수에서 과잉 경쟁을 벌이는 동안, K-엔터 기업들은 일찌감치 국제 시장을 차세대 전장으로 설정했다.
5000만 아닌 80억 시장…'K' 아닌 'K-시스템' 수출
이미 음악 소비 지표는 K팝이 확고한 해외 성장 궤도에 올랐음을 입증한다. 음악 데이터 분석 업체 차트메트릭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팔로워 기준 K팝 팬층 비중은 인도네시아(1위), 미국(2위), 필리핀(3위) 순이었다. 정작 한국은 4위에 그쳤으며, 태국과 브라질이 그 뒤를 이었다.
피보탈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스웨덴에 이어 음악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네 번째 국가로 부상했다. 유튜브 통계상 한국인 1명이 해외 뮤지션을 구독할 때, 외국인 17명이 한국 아티스트를 시청했다.
콘텐츠에도 이런 추세가 반영돼, 지난해 기준 K팝 싱글의 절반 가까이가 영어 가사로 구성됐다. '한국어의 약화'가 아니라 세계 소통 언어로 적응한 결과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세계 시장을 향해 K팝이 'K'를 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정체성의 포기가 아닌 '포용 범위의 확대'를 뜻한다.
K팝 고유의 훈련 체계와 기획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증된 한국식 체계 자체를 해외로 수출하며 국제 표준화를 시도하는 흐름이다. K팝은 문화의 식민지 대상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흡수하며 성장하는 주체인 문화 방식으로 전환 중이다.
만화 영화 'K팝 데몬 헌터스'는 K팝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을 배경으로 한국인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영어로 서사를 풀어나가는 서구식 이야기다. 기고가 줄리아나 리우는 이를 "한국의 혼이 깔린 서구식 이야기"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K팝의 진정한 진화 형태라고 분석했다.
K팝은 국가라는 이름을 넘어선 '문화 기반'으로 옮아가고 있다. 'K'의 발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그 안의 정신, 즉 창의성과 체계성, 감정의 섬세함은 여전히 한국의 것이다. K팝은 이제 국경이 아닌 구조로 규정되며, "한국에서 태어나 세계에서 자라는 음악 산업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CJ ENM의 사례처럼,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의 방식이다.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성공을 거두는 것은 K팝에 문제가 아니라 특권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