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메모리 반도체 패권 놓고 맞붙어…엔비디아 인증이 승부 가를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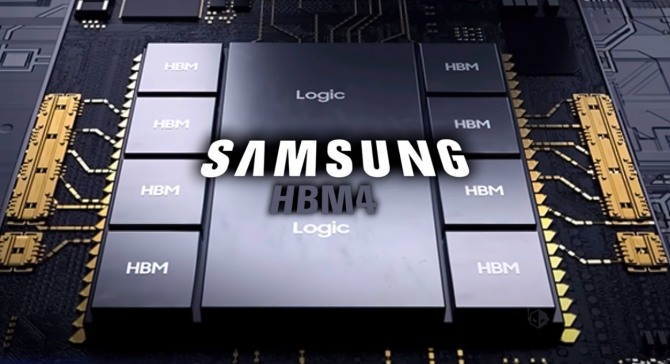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시장조사업체들에 따르면 HBM 시장은 2026년 480억~500억 달러(약 67~70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2030년까지 연평균 68%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20%에서 올해 3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AI 가속기 수요 급증으로 공급 부족 현상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모두에게 전례 없는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SK하이닉스, 70% 시장점유율로 독주 체제
SK하이닉스는 지난 12일 AI 가속기용 HBM4 개발 완료와 함께 세계 최초 양산 체제 구축을 공식 발표했다. HBM4는 데이터 전송 통로를 기존 1024개에서 2048개로 두 배 늘려 대역폭을 2TB/s까지 끌어올렸다. 전력 효율도 40% 이상 개선해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높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 70% 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글로벌 D램 시장점유율 36%로 삼성전자(34%)를 제치고 1992년 이후 처음 1위를 차지했다.
회사는 안정성이 검증된 자사 어드밴스드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 D램을 결합해 생산 위험을 최소화했다. 베이스다이 제작은 TSMC와 협력해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HBM4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인증 돌파구로 반격
삼성전자는 1c(6세대) 나노급 D램 공정과 자사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한 HBM4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이미 출하했다. 회사 측은 "양산 전환 승인을 마치고 2026년 수요 본격화에 맞춰 적기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HBM3E 12-Hi(12층) 제품으로 엔비디아 인증을 획득하며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지난해 4월 열 관리 문제로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악재를 딛고 일어선 것이다. 계약 규모와 내용은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하지만, SK하이닉스 독점 공급 체제에 균열을 낸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D램과 로직 다이를 각각 1c 나노 및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해 집적도와 속도에서 경쟁우위를 노리고 있다. 11Gbps 속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 경쟁사 10Gbps를 웃도는 성능을 추진 중이다.
엔비디아 품질 검증이 승부처
양사 모두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루빈' 탑재를 목표로 삼고 있어, 공급사 선정의 핵심 변수는 엔비디아 품질 검증 통과 여부다.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이 제출한 HBM4 샘플에서 10~11Gbps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최종 합격 시 내년부터 대량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엔비디아 루빈 아키텍처는 GPU당 HBM4 8스택으로 총 288GB 용량과 13TB/s 대역폭을 요구한다. 이는 현세대보다 62.5% 향상된 대역폭으로, 50 PetaFLOPS FP4 연산 성능을 뒷받침할 핵심 기술이다.
마이크론도 급속히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70억 달러(약 9조7900억 원) 싱가포르 팹 투자와 대만 팹의 HBM 생산 전환을 통해 2024년 5~25% 점유율에서 내년 20% 이상 목표를 설정했다.
AI 시대 메모리 패권 좌우할 전략 기술
HBM4는 단순한 메모리 제품을 넘어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메모리 대역폭 증가율이 연산 성능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메모리 장벽'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HBM4의 2TB/s 대역폭이 차세대 AI 모델 훈련과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기술이라고 평가한다. 트릴리언 파라미터 모델 처리와 실시간 AI 응용프로그램의 서브 밀리초 지연시간 달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합쳐 전 세계 HBM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미중 기술 경쟁에서 전략적 위치를 크게 강화했다. 정부도 2030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15만 명 양성과 33조 원 지원책을 발표하며 HBM 중심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다만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와 첨단 장비의 해외 의존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HBM 수출통제 강화로 중국 시장 접근에도 제약이 생긴 상황이다.
양사의 HBM4 양산 경쟁은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적 자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