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새벽 눈길을 걸어/ 인생의 밖으로 걸어가라/ 눈사람도 없이 눈 내리는 나라에서/ 홀로 울며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 그대 눈 내리는 인생의 눈길 밖을 걸어가라// 기다림처럼 아름다움이 없다는/ 인간의 말을 기억하며/ 눈 내리는 인생의 눈길 밖에서/ 그대 눈 속에 한 인간의 일생을 머물게 하라…” -정호승의 ‘새벽 눈길’ 중 일부
딱히 새벽 눈길을 걸어야 인생 밖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도 밟지 않은 숫눈을 밟고 싶은 욕심에 서둘렀음에도 이미 길 위엔 사람들의 발자국이 빼곡히 찍혀 있다. 흰 눈 위에 첫 발자국을 찍고 싶은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으련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간 듯하다. 그렇게 해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길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기다림처럼 아름다움이 없다는 인간의 말을 기억하라는 시인의 속삭임처럼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릴 때 눈만 한 것도 없다.
눈은 누추한 삶의 얼룩들을 지워주고 단숨에 우리를 순수했던 동심의 세계로 데려다준다. 국어사전엔 눈과 관련된 낱말이 30여 개나 된다. 일요일 낮에 내린 눈은 진눈깨비다. 진눈깨비는 비가 섞여 내리는 눈이다. 함박눈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비도, 눈도 아닌 진눈깨비를 만나면 속상할 것이다. 한 길이나 될 만큼 쌓이는 눈은 길눈, 잣눈이다. 발자국이 겨우 날 만큼 내리는 눈은 자국눈이라 한다. 가랑비처럼 잘게 내리는 눈은 가랑눈, 그보다 조금 더 크고 성기게 내리면 포슬눈이다. 물기가 적어 엉기지 않고 바스러지는 모양이 ‘포슬포슬’이니 포슬눈으로는 눈싸움도 할 수 없다. 쌀이 땅에 뿌려지듯 내리는 눈은 싸라기눈인데, 줄여서 싸락눈이라고도 한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바깥의 냉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까 문을 꽁꽁 닫고 커튼까지 쳐놓아 눈이 내린 줄도 모르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 춥더라도 가끔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일이다. 그래야 건강에도 좋고 눈 내린 풍경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눈이 내리면 숲으로 가서 눈길을 걸어볼 일이다. 늘 다니던 길도 눈이 내리면 낯설어지듯 눈 내린 숲의 풍경은 낯설고 낯선 만큼 신비롭고 신선하다. 눈에 덮인 호젓한 산길을 걸으며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눈길을 걸어가듯 조심스럽게 새로운 희망을 향해 발걸음을 떼어 놓는다. 앞서간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도 걷다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길을 벗어나기도 한다. 올해도 우리 삶의 길 위엔 수시로 바람 불고 눈이 내려 흔들리고 미끄러울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람 불어도, 눈이 내려도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아무리 길이 미끄럽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끝내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걷겠다는 굳센 의지만 있다면 분명 올해는 지난해보다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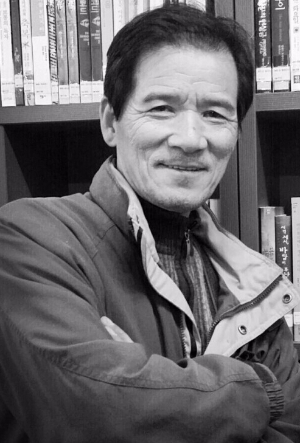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