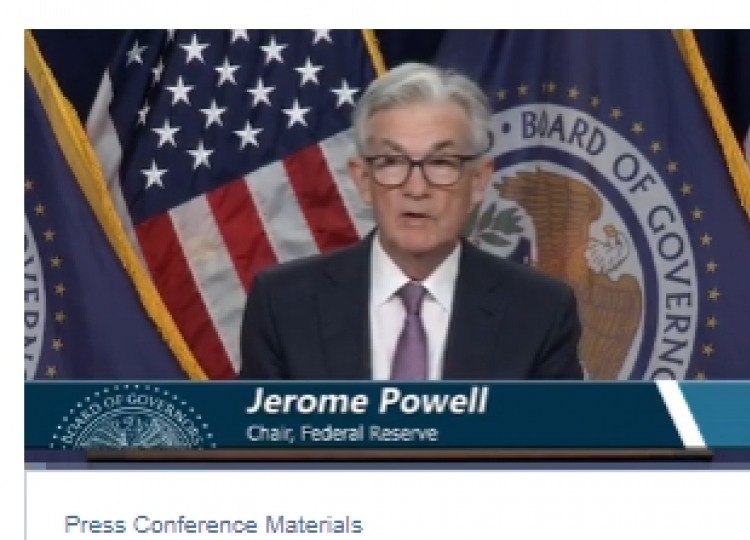현대차 단속 탓에 투자심리 급랭…"예측 불가능한 시장" 경계 확산
LG·SK 재개 속 현대·삼성 등 침묵 길어져…'비자 장벽'도 부담 가중
LG·SK 재개 속 현대·삼성 등 침묵 길어져…'비자 장벽'도 부담 가중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투자자들에게 연이어 재차 확신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단속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 내 한국 및 동아시아 기업들을 대리하는 한 관계자는 한국 투자자들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합의했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공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최근 수년간 자동차, 반도체, 조선, 생명공학 등 다양한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다.
현대차 단속 여파, 대미 투자 신뢰도 하락
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엘라벨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이었다. 단속 주체인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비자 서류 불일치와 고용 자격 규정 위반을 명분으로 출장 중이던 한국인 근로자 및 기술자 약 300명 이상을 구속하고 구금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홍보해 온 이 현장에 대한 행정 집행은 공사 및 협력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시키는 등 한·미 양국 기업 관계에 직접적인 긴장을 초래했다.
이러한 이민 단속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곧바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최소 두 개의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계획했던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했으며, 최소 네 개의 기업이 일시 중단했던 투자의 보류 기간을 연장했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미국-한국 경제 협의회 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한 한국 기업이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었으나, 미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우려해 결국 한국으로 확장 방향을 선회했다"고 전했다. 덴버 로펌 홀랜드 앤 하트(Holland & Hart)의 크리스 토머스 이민 변호사 역시 "한 대형 IT 기업이 현대 사건 이후 미국 진출 계획을 접고 한국이나 인도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투자 위축의 배경은 이민 단속 탓도 있지만,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비자 규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 기업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컨설턴트들은 한국 및 아시아 국적자들이 출장이나 고용주 후원 비자로 미국 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에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하면서 더욱 커졌다.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인트라링크의 조너선 클리브 전무 이사는 "근로자들이 미국 파견을 꺼리는 마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쿠쉬 데사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투자 친화적인 경제로 만드는 데 전념한다"며, "행정부 전체가 '미국에서 만들고, 고용하기' 투자 약속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LG·SK 사업 재개 vs 현대·삼성 침묵…투자 분산 현실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대 공장 단속에 반대했다"고 직접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경주에서 삼성, LG, SK, 현대 등 재계 총수급 인사들과 회동, 비자 문제 해결과 투자 안정성 보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커트 통 전 APEC 주미 대사는 "이번 협정으로 일부 투자자 불안은 완화되겠지만, 현대 사건은 여전히 '잔여 불신'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인트라링크의 조너선 클리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이민·노동 문제를 넘어선 시장 신뢰의 위기로 평가했다. 그는 "조지아 사태는 한 가지 요인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 행정의 혼란스러운 정책 운영이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수년간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결정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행정부의 노력으로 사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 및 동아시아 기업들에게 "미국 현장 위험이 상존한다"는 인식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 미국 말고 한국·인도·동남아 내 시설 확충으로 위험 분산이 빨라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